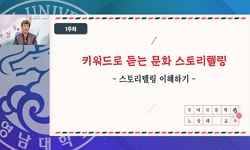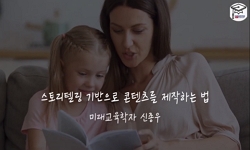전통은 현재를 과거와 엮는 끊임없는 해석에 의해 완전성이 확립되는 개념으로, 시간의 축적과 현재적 해석을 요한다. 한국의 서원(書院)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으로서 유교문화...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9548726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7
-
작성언어
-
- 주제어
-
KDC
300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1273-1293(21쪽)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전통은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며, 정치적 파란과 시대적 부침에 따른 역사적 단절 속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두 가지 착안점에 근거해 전통연구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timeness)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valueness)을 동시에 함축하며 지금 시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그 실체를 주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통이 현재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을 속성을 병렬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통의 요소를 포착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상실된 중간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전통의 실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이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심곡서원의 주향자(主享者)인 조선 중기 문신(文臣)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의 삶을 서원 공간과 연결하고, 서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를 구축해 심곡서원의 “무엇”이 전통으로서 “어떻게” 착근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 구조(분석틀)는 인물, 공간, 상징, 상호작용, 은유의 이야기 항목으로 구성되며, 여러 이야기 항목들이 연결되어 줄거리(plot)를 형성한다. 이야기 주인공인 인물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거나 타자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되는 가운데 상징화(symbolization)되고, 주인공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은유적 공간(metaphoric space)이 창출된다. 한편 이야기 밖의 청자(audience)의 시각은 이야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분석 결과,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는 ‘인물의 생애(조광조 연대기)’, ‘기념의 시대(서원 건립기)’, ‘전통의 시대(의미 창출기)’의 흐름을 통해 전개된다. 각 시기별 흐름에 따라 서원은 “모순의 공간”, “정치적 공간”, “협의(協議)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전통 만들기 주체는 인물, 당대 사람들, 국가·사회로 확장된다. 특히 ‘전통의 시대’에서는 서원이 국가에 의한 공식화 과정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의해 현재적 해석이 더해짐에 따라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이야기의 중심소재인 심곡서원은 도시라는 특유의 공간적 조건 그리고 민주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통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개별 서원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하에서 고유의 스토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포괄하는 전통의 집체(collection)로 다루기 때문에 서원 전통은 오히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된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화두는 전통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검증보다는 수사적(rhetoric) 접근을 촉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원이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단일사례 분석을 통해 지금의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과정 역시 전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고,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보편성은 서원의 건립 취지와 목적에 담긴 유교 정신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전통은 현재를 과거와 엮는 끊임없는 해석에 의해 완전성이 확립되는 개념으로, 시간의 축적과 현재적 해석을 요한다. 한국의 서원(書院)은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으로서 유교문화의 전형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생각에 기초해 서원의 의미와 가치에 주목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전통문화의 보편성을 발견하고, 그 보편성이 어떠한 특질로 이루어지는지 분석하고자 현대적인 면모를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도시에 위치한 심곡서원(深谷書院)이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은 사회적 맥락과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며, 정치적 파란과 시대적 부침에 따른 역사적 단절 속에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두 가지 착안점에 근거해 전통연구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전통이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시간성(timeness) 그리고 현재적 의미라는 가치성(valueness)을 동시에 함축하며 지금 시점에서의 해석을 통해 그 실체를 주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명제에 입각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전통이 현재의 해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라면 과거와 현재의 시점에서 전통을 속성을 병렬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전통의 요소를 포착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은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상실된 중간과정을 복원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서 전통의 실체를 규정하는 데 있어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다. 이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심곡서원의 주향자(主享者)인 조선 중기 문신(文臣) 정암 조광조(靜庵 趙光祖))의 삶을 서원 공간과 연결하고, 서원과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를 구축해 심곡서원의 “무엇”이 전통으로서 “어떻게” 착근되는지를 제시하였다.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 이야기 구조(분석틀)는 인물, 공간, 상징, 상호작용, 은유의 이야기 항목으로 구성되며, 여러 이야기 항목들이 연결되어 줄거리(plot)를 형성한다. 이야기 주인공인 인물은 주체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거나 타자에 의해 정체성이 규정되는 가운데 상징화(symbolization)되고, 주인공을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으로 은유적 공간(metaphoric space)이 창출된다. 한편 이야기 밖의 청자(audience)의 시각은 이야기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분석 결과, <심곡서원 전통 만들기>는 ‘인물의 생애(조광조 연대기)’, ‘기념의 시대(서원 건립기)’, ‘전통의 시대(의미 창출기)’의 흐름을 통해 전개된다. 각 시기별 흐름에 따라 서원은 “모순의 공간”, “정치적 공간”, “협의(協議)의 공간”으로서 의미가 부여되고, 전통 만들기 주체는 인물, 당대 사람들, 국가·사회로 확장된다. 특히 ‘전통의 시대’에서는 서원이 국가에 의한 공식화 과정을 통해 권위를 획득하고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의해 현재적 해석이 더해짐에 따라 전통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즉 이야기의 중심소재인 심곡서원은 도시라는 특유의 공간적 조건 그리고 민주화된 의사결정이 보편화된 시대적 조건 속에서 전통으로 뿌리내리는 것이다.
개별 서원마다 각기 다른 역사적 맥락하에서 고유의 스토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조선시대 유교문화를 포괄하는 전통의 집체(collection)로 다루기 때문에 서원 전통은 오히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인식된 경향이 있다. 더군다나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화두는 전통에 대한 실증적·경험적 검증보다는 수사적(rhetoric) 접근을 촉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원이 전통으로 착근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단일사례 분석을 통해 지금의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합의 과정 역시 전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함을 제안하였고, 한국의 서원이 지니는 보편성은 서원의 건립 취지와 목적에 담긴 유교 정신의 내용 그 자체보다는 전통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결론으로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행정학회
- 정해일 ( Haeil Jung )
- 2017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정부 재정배분 및 행정서비스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한국행정학회
- 오영민
- 2017
-
- 한국행정학회
- 박이석
- 2017
-
- 한국행정학회
- 오성택
- 2017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