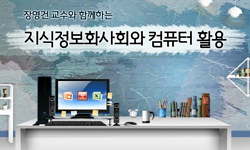본 연구는 해석학적 경험이론과 대화의 특성에 관한 이론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적용한 미술 감상법 구안에 대...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502168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미술교육전공 , 2019. 2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향미
-
UCI식별코드
I804:11043-000000068029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교육은 전통적 인식론을 대표하는 객관주의에 근거한 교수·학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이 있고 학습자가 교수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의견이 교수자 즉, 선생님과 다른 생각이라면‘틀린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교실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여러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미술작품 감상이 미술 작품을 매개로 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고 미적, 정서적인 감흥을 이끌어 내는 행위라고 가정할 때,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인 감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기존의 미술 감상교육은 감상자의 주관은 배제한 채 주로 작품 속에 내재한 의미 읽기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감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식전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술작품은 작가가 물질적,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하나의 매개물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있는,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관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감상자가 그것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 작품은 작가의 주관으로 구성된 주관적인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작품 감상은 하나의 획일적인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매개로 감상자와 작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의미 있는 미술 감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통해 존재한다. 과거의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어떠한 것, 즉 대상에 대한 앎은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지식이라 칭하며 그것의 맹목적인 입력을 잘 수행해내는 것으로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성취도를 판단한다. 물론 교과지식으로서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의 과정, 지식의 형성 더 나아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해석학적 인식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기존의 교육은 단편적이고 지식의 입력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해석학(Hermeneutices)은‘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hermenia'에서 시작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해석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Hans George Gadamer)의 해석학은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학의 흐름 중 하나이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경험이론에서는 앎의 과정을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명제로 설명한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데 과거현재미래, 즉 한 사람 안에서 시간적 거리 둠을 통해서만 앎이 구성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이‘이해’를 탐구하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련의 요소들 즉, 시간적 거리 둠, 인식 지평의 확장, 선입견, 나아가 대화의 방식 등은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인식주체에게 능동적인 사고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경험이론이 미술 감상교육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첫째, 인식주체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나간다는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맥락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지식의 형성과 지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중점으로 하는 인식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가다머의 해석학적 경험이론이‘이해’를 탐구하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련의 요소들, 즉 시간적 거리 둠, 인식 지평의 확장, 선입견, 대화의 방식 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해석자로서의 감상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넷째, 감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술 감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학습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미술 감상수업을 위해 각각의 유형의 특성과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여 학습자가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해석학적 지식관과 미술 감상의 특성에 기반하여 해석학적 경험이론의 중심이 되는‘언어의 사변적 구조’와 예술작품의 존재구조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작품에 내재된 의미는 없고,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와 작품, 감상자와 교수자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화중심 감상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곱째, 해석학적 경험이론과 대화중심 감상법이 실질적으로 연결 가능한지에 대한 탐구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수업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감상자들은 대화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절대적 불변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아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에 동의하는 입장에 선다면, 지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개방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대화를 통한 선입견의 자각과 성찰, 서로 다른 지평들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지평의 융합 등을 통해 지식은 언제든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해에 대해 탐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경험이론을 기반으로 대화중심 감상법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서 해석이란 교과가 제시하는 가치를 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이해라는 것은 ‘내가 너 되어보기.’, 다른 말로 감정이입 이라할 수 있다. 우리는 미술 감상을 통해 창작자의 사유 속으로 들어가 작품을 통해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 등을 느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직관과 사유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술 감상은 예술 경험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미술 감상을 통한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예술을 다루는 미술 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쟁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술 교과는 더욱 미술 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발은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주제어: 감상교육, 대화, 해석학적 경험이론, 지식, 감상자.
본 연구는 해석학적 경험이론과 대화의 특성에 관한 이론 검토와 사례 연구를 통해 미술 감상교육에서 대화의 의미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적용한 미술 감상법 구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우리나라 교육은 전통적 인식론을 대표하는 객관주의에 근거한 교수·학습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나의 문제 또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답만이 있고 학습자가 교수자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의견이 교수자 즉, 선생님과 다른 생각이라면‘틀린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교실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우리는 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 여러 지식을 머릿속에 저장하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무엇에 대한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미술작품 감상이 미술 작품을 매개로 작품과의 대화를 통해 자기 자신을 만나고 미적, 정서적인 감흥을 이끌어 내는 행위라고 가정할 때,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인 감상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진다. 그러나 기존의 미술 감상교육은 감상자의 주관은 배제한 채 주로 작품 속에 내재한 의미 읽기 위주의 교육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감상자의 개인적, 사회적 맥락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지식전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술작품은 작가가 물질적, 시각적 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미지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하나의 매개물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자면 작품은 작가의 생각과 감정이 담겨있는,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주관적인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의 감상자가 그것을 보고 작가의 의도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만의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 작품은 작가의 주관으로 구성된 주관적인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작품 감상은 하나의 획일적인 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매개로 감상자와 작품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감상자의 삶에 영향을 줄 때, 의미 있는 미술 감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를 통해 존재한다. 과거의 내가 겪지 않았더라면 몰랐을 어떠한 것, 즉 대상에 대한 앎은 나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은 학습자 개개인의 맥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누군가의 주관적인 의견을 지식이라 칭하며 그것의 맹목적인 입력을 잘 수행해내는 것으로 학습자의 지식에 대한 성취도를 판단한다. 물론 교과지식으로서의 지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학습의 과정, 지식의 형성 더 나아가 이해의 과정을 통해 이해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해석학적 인식론에 입각해서 본다면, 기존의 교육은 단편적이고 지식의 입력만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해석학(Hermeneutices)은‘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hermenia'에서 시작된 말이다. 일반적으로 의미의 해석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독일의 철학자 가다머(Hans George Gadamer)의 해석학은 교육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석학의 흐름 중 하나이다. 가다머의 해석학적 경험이론에서는 앎의 과정을 이해의 역사성’이라는 명제로 설명한다. 역사성이라는 것은 시간을 내포하고 있는데 과거현재미래, 즉 한 사람 안에서 시간적 거리 둠을 통해서만 앎이 구성되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이‘이해’를 탐구하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련의 요소들 즉, 시간적 거리 둠, 인식 지평의 확장, 선입견, 나아가 대화의 방식 등은 지식을 구성해나가는 인식주체에게 능동적인 사고의 형성을 도와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경험이론이 미술 감상교육에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였다. 이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첫째, 인식주체가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나간다는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지식 형성 과정에서의 맥락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둘째, 지식의 형성과 지식의 본질에 대한 탐구를 중점으로 하는 인식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셋째, 가다머의 해석학적 경험이론이‘이해’를 탐구하기 위해 접근하기 위해 도입하는 일련의 요소들, 즉 시간적 거리 둠, 인식 지평의 확장, 선입견, 대화의 방식 등의 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해석자로서의 감상자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넷째, 감상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술 감상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학습 유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미술 감상수업을 위해 각각의 유형의 특성과 방법을 명확히 파악하여 학습자가 감상활동을 통해 미술에 대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섯째, 앞서 살펴본 해석학적 지식관과 미술 감상의 특성에 기반하여 해석학적 경험이론의 중심이 되는‘언어의 사변적 구조’와 예술작품의 존재구조가 유사한 성질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작품에 내재된 의미는 없고, 작품의 의미는 감상자와 작품, 감상자와 교수자의 대화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대화중심 감상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일곱째, 해석학적 경험이론과 대화중심 감상법이 실질적으로 연결 가능한지에 대한 탐구로 실제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수업 분석을 진행한 결과 감상자들은 대화를 통해 나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에 의하면 지식은 절대적 불변의 가치를 지닌 무언가가 아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에 동의하는 입장에 선다면, 지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는 개방성을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 대화를 통한 선입견의 자각과 성찰, 서로 다른 지평들의 만남과 충돌, 그리고 지평의 융합 등을 통해 지식은 언제든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석학적 경험이론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해에 대해 탐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학적 경험이론을 기반으로 대화중심 감상법에 대해 논하였다. 여기서 해석이란 교과가 제시하는 가치를 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결국 이해라는 것은 ‘내가 너 되어보기.’, 다른 말로 감정이입 이라할 수 있다. 우리는 미술 감상을 통해 창작자의 사유 속으로 들어가 작품을 통해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괴로운 감정 등을 느껴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작품을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직관과 사유가 동시에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미술 감상은 예술 경험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미술 감상을 통한 일련의 과정들은, 내가 너의 입장이 되어 이해해 보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일은 예술을 다루는 미술 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경쟁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미술 교과는 더욱 미술 교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한다.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개발은 후속연구의 과제이다.
주제어: 감상교육, 대화, 해석학적 경험이론, 지식, 감상자.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we assume that appreciation of art works is a behavior of meeting one's self and drawing the aesthetic and emotional fun through conversations with the works by a medium of art works, the role of an appreciator, the main agent appreciating works,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 existing art appreciation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for the reading of the meaning implied in works, with the views of appreciators excluded. It also remains at the level of one-sided knowledge transfer.
Hermeneutices came from Latin 'hermenia' meaning 'interpret'. Generally, it refers to a theory on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Hermeneutics of Hans George Gadamer, a German philosopher, is one of the flows of Hermeneutices that the educational world considers important. Hans George Gadamer's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explains the process of knowledge as 'the historicality of understanding'. Historicality includes time and is that knowledge can be composed and understood through only putting temporal distance in the pastpresentfuture, namely, a person. It is judged that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is that a series of elements which will be introduced to explore and have access to 'understanding' - putting a temporal distance, expansion of a cognitional horizon, prejudice, a method of conversation by extension, etc. - are a process to help the cognition subject that composes knowledge to form positive thoughts.
This study discussed a conversation-centered appreciation method based on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The interpretation here does not mea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that a text book presents to suit a frame, but the capacity to critically accept it. Ultimately, it can be said that understanding is 'I become you.', in other words, empathy. We can feel pleasure, anger, sadness, agony, etc. through works in the thinking of creators through art appreciation . However, just looking at works does not make appreciators feel this way. It is not possible until intuition and thinking operate simultaneously.
Art appreciation derives art experience. And a series of processes through art appreciation are 'my attempt to be in your place'. Only an art subject can provide these experiences. In the current situation called a competitive society, an art subject has to find specific things that only it can do. The development of teaching - learning method to practice it is a task for a follow-up study.
Key words: Appreciation education, Conversation,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Knowledge, Appreciat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review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and the theor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versations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rough a case study, but to provide the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not only to review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and the theor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versation and understand the meaning of conversations in art appreciation education through a case study, but to provide their implications of a plan for the art appreciation method using it.
When we assume that appreciation of art works is a behavior of meeting one's self and drawing the aesthetic and emotional fun through conversations with the works by a medium of art works, the role of an appreciator, the main agent appreciating works,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 existing art appreciation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mainly for the reading of the meaning implied in works, with the views of appreciators excluded. It also remains at the level of one-sided knowledge transfer.
Hermeneutices came from Latin 'hermenia' meaning 'interpret'. Generally, it refers to a theory on the interpretation of meaning. Hermeneutics of Hans George Gadamer, a German philosopher, is one of the flows of Hermeneutices that the educational world considers important. Hans George Gadamer's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explains the process of knowledge as 'the historicality of understanding'. Historicality includes time and is that knowledge can be composed and understood through only putting temporal distance in the pastpresentfuture, namely, a person. It is judged that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is that a series of elements which will be introduced to explore and have access to 'understanding' - putting a temporal distance, expansion of a cognitional horizon, prejudice, a method of conversation by extension, etc. - are a process to help the cognition subject that composes knowledge to form positive thoughts.
This study discussed a conversation-centered appreciation method based on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The interpretation here does not mea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that a text book presents to suit a frame, but the capacity to critically accept it. Ultimately, it can be said that understanding is 'I become you.', in other words, empathy. We can feel pleasure, anger, sadness, agony, etc. through works in the thinking of creators through art appreciation . However, just looking at works does not make appreciators feel this way. It is not possible until intuition and thinking operate simultaneously.
Art appreciation derives art experience. And a series of processes through art appreciation are 'my attempt to be in your place'. Only an art subject can provide these experiences. In the current situation called a competitive society, an art subject has to find specific things that only it can do. The development of teaching - learning method to practice it is a task for a follow-up study.
Key words: Appreciation education, Conversation, Hermeneutic Experimental Theory, Knowledge, Apprecia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Ⅱ. 이론적배경 = 6
- Ⅲ. 감상과 미술교육 = 37
- Ⅳ.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 44
- Ⅴ. 대화중심 감상법을 적용한 중학교 감상지도의 실제 = 51
- Ⅰ. 서론 = 1
- Ⅱ. 이론적배경 = 6
- Ⅲ. 감상과 미술교육 = 37
- Ⅳ. 2015 개정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 44
- Ⅴ. 대화중심 감상법을 적용한 중학교 감상지도의 실제 = 51
- Ⅵ. 결론 =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