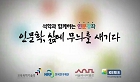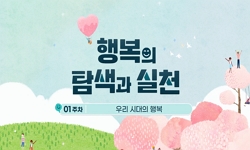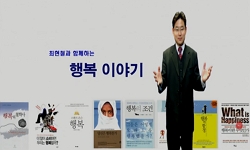The early Buddhist literature dipicts the achievement of the Buddha’s enlightenment through the practice of the fourfold Dhyāna after abandoning ascetic practices. Within the training of the fourfold Dhyāna, the “Happiness (sukha)” take p...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정려의 구성요소를 둘러싼 여러 학파의 해석 (1)__행복의 실체 논쟁을 중심으로__ =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Factor of Dhyāna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6172468
-
저자
김성철 (금강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9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정려 ; 행복 ; 경안 ; 설일체유부 ; 경량부 ; 유가행파 ; dhyāna ; sukha ; praśrabdhi ; Sarvāstivādin ; Sautrātika ; Yogācāra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47-82(36쪽)
-
KCI 피인용횟수
1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arvāstivādin regards the sukha of the first and the second dhyāna not as a feeling which belongs to the body (kāyikī vedanā) but as a praśrabdhi and considers the sukha of the third dhyāna as the feeling which belongs to the mind (caitasikī vedanā). This holds a systematic consistency with the theory of mind that does not admit the occurrence of the consciousness of body (kāyavijñāna) from the second dhyāna upward. In comparison, Sautrāntika considers the sukha of all three dhyānas as kāyikī vedanā. This suggests that Sautrāntika, like Mahāsāṃghika, admits the occurrence of the kāyavijñāna within the dhyāna.
The earliest Yogācāra literature considers the sukha of first two dhyānas as a praśrabdhi like as Sarvāstivādin. However, immediately after the introduction of ālayavijñāna, Yogācāra school seems to consider the sukha as to the kāyikī vedanā. This coincides with the opinion of Sautrāntika, though the sukha is not combined with the consciousness of body but with ālayavijñāna, because the Yogācāra school also does not admit the occurrence of the kāyavijñāna from the second dhyāna upward.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sukha as a factor of dhyāna would reflect basically the subtleness (sūkṣma) of mental and physical experiences that occur in the medi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experiences eventually has to rel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each schoo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factors of dhyāna by each school, result from a different theoretical view of each school rather than a different actual experience.
The early Buddhist literature dipicts the achievement of the Buddha’s enlightenment through the practice of the fourfold Dhyāna after abandoning ascetic practices. Within the training of the fourfold Dhyāna, the “Happiness (sukha)” take part as an important element which contrasts with ascetic practices. However, the Buddhist schools have different interpretations toward the sukha.
Sarvāstivādin regards the sukha of the first and the second dhyāna not as a feeling which belongs to the body (kāyikī vedanā) but as a praśrabdhi and considers the sukha of the third dhyāna as the feeling which belongs to the mind (caitasikī vedanā). This holds a systematic consistency with the theory of mind that does not admit the occurrence of the consciousness of body (kāyavijñāna) from the second dhyāna upward. In comparison, Sautrāntika considers the sukha of all three dhyānas as kāyikī vedanā. This suggests that Sautrāntika, like Mahāsāṃghika, admits the occurrence of the kāyavijñāna within the dhyāna.
The earliest Yogācāra literature considers the sukha of first two dhyānas as a praśrabdhi like as Sarvāstivādin. However, immediately after the introduction of ālayavijñāna, Yogācāra school seems to consider the sukha as to the kāyikī vedanā. This coincides with the opinion of Sautrāntika, though the sukha is not combined with the consciousness of body but with ālayavijñāna, because the Yogācāra school also does not admit the occurrence of the kāyavijñāna from the second dhyāna upward.
The different opinions on the sukha as a factor of dhyāna would reflect basically the subtleness (sūkṣma) of mental and physical experiences that occur in the medi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se experiences eventually has to rely on the philosophical background an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each school.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pretation of factors of dhyāna by each school, result from a different theoretical view of each school rather than a different actual experience.
국문 초록 (Abstract)
유부는 초정려와 제2정려의 행복을 신체에 속하는 느낌이 아닌 경안이라고 하고, 제3정려의 행복은 정신적 느낌의 행복이라고 한다. 이는 제2정려 이상에서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심식론과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경량부는 세 정려의 행복이 모두 신체에 속하는 느낌으로 간주한다. 이는 경량부가, 대중부 등과 마찬가지로, 정려에서도 신식의 발생을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알라야식이 도입되기 이전 최초기 유가행파 문헌에서는 유부와 마찬가지로 정려의 행복을 경안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라야식의 도입 직후에는 정려지의 행복을 신체에 속하는 느낌으로 간주한다. 이는 경량부 견해와 일치한다. 다만 이 행복은 신식이 아니라 알라야식과 결합한 느낌이다. 유가행파도 제2정려 이상에서는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려지의 행복에 대한 제 학파의 견해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명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경험의 미세함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해석은 결국 각 학파가 가진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 토대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각 학파의 정려지 해석에서 보이는 차이는 실제적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각 학파가 가진 이론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초기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고행을 버린 후, 4정려를 닦아 깨달음에 이른 것으로 묘사된다. 4정려의 수습에서는 고행에 대비되는 “행복”이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하지만 이에 대한 ...
초기경전에서는 석가모니 붓다가 고행을 버린 후, 4정려를 닦아 깨달음에 이른 것으로 묘사된다. 4정려의 수습에서는 고행에 대비되는 “행복”이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파적 해석은 일정하지 않다.
유부는 초정려와 제2정려의 행복을 신체에 속하는 느낌이 아닌 경안이라고 하고, 제3정려의 행복은 정신적 느낌의 행복이라고 한다. 이는 제2정려 이상에서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는 심식론과 체계적 정합성을 가진다. 이에 비해 경량부는 세 정려의 행복이 모두 신체에 속하는 느낌으로 간주한다. 이는 경량부가, 대중부 등과 마찬가지로, 정려에서도 신식의 발생을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알라야식이 도입되기 이전 최초기 유가행파 문헌에서는 유부와 마찬가지로 정려의 행복을 경안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알라야식의 도입 직후에는 정려지의 행복을 신체에 속하는 느낌으로 간주한다. 이는 경량부 견해와 일치한다. 다만 이 행복은 신식이 아니라 알라야식과 결합한 느낌이다. 유가행파도 제2정려 이상에서는 신식의 발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정려지의 행복에 대한 제 학파의 견해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명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신체적 경험의 미세함을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의 해석은 결국 각 학파가 가진 철학적 배경과 이론적 토대에 기반할 수 밖에 없다. 각 학파의 정려지 해석에서 보이는 차이는 실제적 경험의 차이에서 유래한다기 보다는 각 학파가 가진 이론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1 衆賢, "현종론"
2 無著, "현량성교론"
3 틸만 페터,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씨아이알 2009
4 瞿曇僧伽提婆, "중아함경"
5 佛陀耶舍共竺佛念, "장아함경"
6 法救, "잡아비담심론"
7 야마베 노부요시, "유식과 유가행" 씨아이알 169-203, 2012
8 窺基, "유가사지론약찬"
9 彌勒, "유가사지론"
10 遁倫, "유가론기"
1 衆賢, "현종론"
2 無著, "현량성교론"
3 틸만 페터, "초기불교의 이념과 명상" 씨아이알 2009
4 瞿曇僧伽提婆, "중아함경"
5 佛陀耶舍共竺佛念, "장아함경"
6 法救, "잡아비담심론"
7 야마베 노부요시, "유식과 유가행" 씨아이알 169-203, 2012
8 窺基, "유가사지론약찬"
9 彌勒, "유가사지론"
10 遁倫, "유가론기"
11 世親, "오온론"
12 김성철, "알라야식의 기원에 관한 최근의 논의 ─람버트 슈미트하우젠과 하르트무트 뷔셔를 중심으로" 불교학연구회 26 : 7-45, 2010
13 法勝, "아비담심론"
14 無著, "아비달마집론"
15 衆賢, "순정리론"
16 슈미트하우젠, "성문지에서의 선정수행과 해탈경험"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1 : 125-129, 2006
17 大木乾連, "법온족론"
18 五百阿羅漢, "대비바사론"
19 이종철, "구사론-계품・근품・파아품" 한국학중앙연구원 2015
20 世親, "구사론"
21 聲聞地硏究會, "瑜伽論 聲聞地 第二瑜伽處" 山喜房佛書林 2007
22 袴谷憲昭, "唯識思想論考" 大蔵出版 321-361, 2001
23 藤田宏達, "俱舍論所引の阿含經一覽" 北海道大學文學部印度哲學硏究室 1984
24 本庄良文, "俱舍論所依阿含全表 I" 私家版 1984
25 櫻部 建, "俱舍論の原典解明" 大藏出版 2004
26 水野弘元, "パーリ佛敎を中心とした佛敎の心識論" ピタカ 1978
27 山部宜能, "アーラヤ識説の實踐的背景について" 33 : 1-30, 2016
28 김준호, "『아비달마구사론』에 나타난 사선정(四禪定)의 의미와 의의" 새한철학회 80 (80): 161-177, 2015
29 山部宜能, "『瑜伽師地論』「摂決択分」におけるアーラヤ識の第一論証の解釈について" 8 : 123-143, 2015
30 Karunesha Shukla, "Śrāvakabhūmi of Ācārya Asaṅga" J.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3
31 YAMABE Nobuyoshi, "Ālayavijñāna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46 : 283-319, 2018
32 SCHMIHAUSEN, Lambert, "Ālayavijñāna - On the Origin and the Early Development of a Central Concept of Yogācāra Philosophy, Part I, II" 1987
33 Hartmut Buescher, "Triṁś Sthiramati's Triṁśikāvijñaptibhāṣya -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Text and its Tibetan Translation" Verlag der Ö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7
34 P. Pradhan, "Tibetan Sanskrit Work Series 8" 1975
35 BRONKHORST, Johannes, "The Two Traditions of Meditaiton in Ancient India" Motilal Banarsidass Publshers 1993
36 DELANU, Florin, "The Chapter on the Mundane Path (Laukikamārga) in the Śrāvakabhūmi, vol. I, II"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2006
37 Feer, "Saṃyutta Nikāya" PTS 1884
38 DELHEY, Martin, "Samāhitā Bhūmiḥ: Das Kapitel über die meditative Versenkung im Grundteil der Yogācārabhūmi Teil 1, 2" ATBSt 2009
39 DELHEY, "Samāhitā Bhümiḥ of the YBh"
40 LI Xuezhu, "Pañcaskandhaka"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China Tibetology Research Center 2008
41 KUAN, Tse-fu, "Mindfulness in Early Buddhism: New approaches through psychology and textual analysis of Pāli, Chinese and Sanskrit sources , Abingdon" Routledge 2008
42 Trenchner, "Majjhima Nikāya" PTS 1888
43 BAREAU, André, "Les Sectes Bouddhiques du Petit Véhicule" 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1955
44 PĀSĀDIKA, "Kanonische Zitate im Abhidharmakosabhāṣya des Vasubandhu" Vandenhoeck & Ruprecht 1989
45 JRAS, "Fragments From the Abhidharmasamuccaya of Asaṅga" 23 : 13-38, 1947
46 N. Tatia, "Abhidharmasamuccaya-bhāṣya" K. P. Jayaswal Research Institute 1976
47 P. Pradhan, "Abhidharmasamuccaya" 1950
48 U. Wogihara, "AKVy Sphuṭārthā Abhidharmakośavyākhyā by Yaśomitra" The Sankibo Press 1971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성스러움과 합리성의 교차점__수행 전통을 통해 본 인도 사유의 종교와 철학__
- 인도철학회
- 성청환
- 2019
- KCI등재
-
- 인도철학회
- 심준보
- 2019
- KCI등재
-
힌두민족국가 개념의 구체화__사바르까르(V. D. Savarkar)의 ‘힌두 라슈뜨라’를 중심으로__
- 인도철학회
- 이지은
- 2019
- KCI등재
-
- 인도철학회
- 박금표
- 2019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4-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8-10-1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 Society for Indian Philosophy |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38 | 0.38 | 0.4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9 | 0.4 | 1.24 | 0 |




 KCI
KCI KISS
KI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