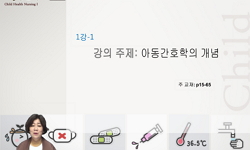오늘날 교육받은 주체는 타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타자의 고통을 문제로 삼지 못하는 오늘날 교육을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 애도의 페다고지를...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애도의 페다고지 : 주디스 버틀러의 ‘취약성’과 ‘공거의 윤리’를 중심으로 = The Pedagogy of Mourning : based on Judith Butler’s ‘Vulnerability’ and ‘the Ethics of Cohabitation
한글로보기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교육받은 주체는 타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가? 이 연구는 과도한 자기중심성에 빠져 타자의 고통을 문제로 삼지 못하는 오늘날 교육을 성찰하고, 그 대안으로 애도의 페다고지를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적 조건 속에서 교육은 주체의 자아실현과 경제적인 역량 키우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반면에 삶의 본질적 취약성과 윤리의 문제는 쉽게 다루지 못한다. 특히 타자의 죽음은 공동체적 삶의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안에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거나 주변적인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타자의 죽음에 대한 충실한 애도야말로 오늘날 교육이 회복해야하는 윤리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논의를 위해, 세계적으로 난무하는 혐오와 폭력에 대항하여 약자들의 연대와 정치적 실천을 고민했던 주디스 버틀러의 애도론을 참조하였다. 먼저, 오늘날 교육이 애도를 다루지 못하는 원인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이란 특정한 교육내용을 지칭하기보다는, 모든 교육행위를 미래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내는 교육이데올로기를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를 경영하는 자율적인 주체와 메리토크라시 윤리를 우상화함으로써 지탱된다. 그러나 그 구조 속에서 교육받은 주체들은 약속된 좋은 삶을 마냥 누리기보다는 우울, 불안, 소진 등 심리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신자유주의 교육이데올로기가 주체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오늘날의 교육을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정동의 형식을 통해 설명한다. 신자유주의 교육의 주체들은 교육을 통해 좋은 미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러한 꿈을 기반으로 강박적으로 자기성장의 명령을 수행한다. 개인의 성장과 경제적 유용성은 오늘날 교육의 윤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이 약속하는 좋은 미래가 텅 빈 기호에 불과하고, 그에 도달하는 과정이 자기착취적라는 점에서 교육의 낙관주의는 잔혹한 성격을 띠게 된다. 잔혹한 낙관주의는 미래에 대한 애착을 지속하기 위해 대상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거부함으로써 애도를 어렵게 만드는 조건이 된다. 오늘날 교육이 처한 총체적인 패착을 넘어서기 위하여, 본 연구는 애도를 바탕으로 교육의 윤리를 재사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애도의 조건과 정치윤리학을 폭넓게 논의한 포스트구조주의 철학자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 1956-)를 참조하였다. 버틀러를 통해 풀고자 한 질문은 총 두 가지이다. 첫째, 타자를 애도할 수 있는 주체의 존재론적 조건은 무엇인가? 주체의 과도한 자기중심성이 애도를 어렵게 만든다면, 충실한 애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버틀러는 자연적 본질이라 여겨지는 생물학적 성을 젠더규범의 산물로 이해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체관념을 전복한다. 버틀러에 따르면 주체는 자율적거나 독립적이기보다는 타자에 의해 허물어지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주체는 담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이는 타자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주체의 조건이다. 둘째, 애도의 철학적이고 정치윤리학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버틀러의 애도는 9/11 테러와 전쟁이라는 시대적 맥락과 정치윤리학에 대한 사상적 관심 속에서 논의되는 개념이다. 버틀러는 초기 이론에서 젠더권력에서 소외된 여성과 성소수자의 삶에 관심을 가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젠더, 계급, 인종, 탈식민주의, 장애 등 다양한 약자성의 조건을 두루 아우를 수 있는 보편적 윤리를 고민해 나갔다. 특히, 9/11과 국가주의적 전쟁은 애도를 중심으로 윤리적 사유를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버틀러의 애도를 크게 철학적 의미와 정치윤리학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본다. (1)애도는 타자중심적인 존재론을 함의한다. 우리가 타자의 죽음 앞에 감당 못할 슬픔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가 처음부터 타자에 연루된 방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타자의 죽음은 얼굴로서 다가와 애도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윤리적 명령을 내린다. 애도를 통해 삶의 본원적인 취약성과 불확실성이 드러나며, 이는 윤리적 공동체를 꾸려나갈 수 있는 존재론적 바탕이 된다. (2)애도는 정치윤리학적 맥락에서 복잡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 세계에는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이 존재하며, 이들은 그 사회에서 살만한 삶으로 인정되지 못한 채 비인간화된다. 따라서 애도되지 못하는 죽음을 적극적으로 애도하려는 노력은 타자의 삶에 공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실천적인 행위가 된다. 그러나 타자의 억압, 고통, 죽음은 분명하게 포착될 수 없는 심연의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애도는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애도는 실패를 통해서 수행될 수밖에 없는 윤리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의 잔혹한 낙관주의에 대항하는 애도의 페다고지가 제안된다. 타자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교육이란 자기중심적 성장에 갇힌 교육을 반성하고 넘어서는 대안적인 교육의 원리를 의미한다. 애도의 페다고지는 주체의 차원, 타자중심적 윤리의 차원, 공동체의 차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애도의 페다고지는 교육받은 주체의 경계를 허문다. 애도는 존재 본연의 취약성과 삶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기에, 애도를 수행하는 주체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허물어내고 윤리적인 실천을 행할 수 있다. 이러한 주체를 바탕으로 교육적 성장을 자율성의 증진이 아닌 타자와 더불어 공통의 토대를 풍부하게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다. 둘째, 애도의 페다고지에서 교육의 윤리는 주체의 내부가 아닌 타자를 향한다. 애도는 타자의 삶을 살만한 것으로 만듦으로써 자기성장의 윤리를 넘어서 타자중심적 윤리를 실천하는 작업이다. 교육은 무조건적인 환대라는 윤리적 토대를 바탕으로 성립되며, 타자가 해석불가능한 심연이라는 사실을 성찰함으로써 윤리를 지속할 수 있다. 셋째, 잔혹한 낙관주의가 ‘개인의 좋은 삶’을 약속한다면 애도의 페다고지는 ‘함께 거주하기’를 교육의 미래로 제시한다. 애도의 페다고지는 생명정치의 구조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동참하기, 상호의존적 돌봄을 바탕으로 정동적 삶을 회복하기, 미디어와 문화번역을 매개로 타자의 고통과 죽음에 귀 기울이기 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이는 애도를 바탕으로 공거의 토대를 구축하는 교육의 모습이다. 결론적으로 애도의 페다고지는 현대사회의 무너지고 소진된 삶들을 회복하는 교육이고, 슬픔과 고통, 두려움 등 소외된 정동의 가치를 되살리는 교육이며, 궁극적으로는‘함께 살아가기’를 모색하는 민주주의적 교육의 한 가지 실천양상이다. 애도의 실천을 통해 교육은 잔혹한 낙관의 굴레에서 빠져나와 비로소 그 고유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econd, what is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ethical meaning of mourning? Butler's mourning is a concept discussed in the experiences of 9/11 and ideological interests in political ethics. Butler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women and sexual minorities who were alienated from gender power in early theories, and based on this, she considered the universal ethics that could encompass various conditions of the weak, such as gender, class, race, post-colonialism, and disability. In particular, 9/11 and the wa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thinking centering on mourning. This study examined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ethical meanings of Butler's mourning. (1) mourning implies the ontology of other-centeredness. We feel unbearable sadness in the face of the other’s death because we exist in the way we were involved in the other from the beginning. The death of the other comes as ‘the face’, giving an irresistible ethical command to mourn. Vulnerability and precariousness in life are revealed through mourning, which serves as an ontological basis for building an ethical community. (2) mourning is a complex problem in a political-ethical context. In the real world, there are deaths that cannot be mourned, and they are dehumanized without being recognized as livable lives. Therefore, the effort to mourn the unmournable death is a practical act that gives public meaning to the lives of others. But since the oppression, pain, and death that belong to the other are an abyss that cannot be clearly captured, mourning always faces a limit. In other words, mourning is possible through its constant failure.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pedagogy of mourning was proposed against the cruel optimism of education. Education that can mourn the death of others means an alternative principle of education that reflects on education trapped in self-centered growth. The pedagogy of mourning was presented in the dimension of the subject, the other-centered ethics, and the community. First, the pedagogy of mourning breaks the boundaries of the educated subject. Mourning reveals vulnerability and precariousness in life, and the subject of mourning can escape from egocentrism through ethic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this, educational growth can be reconceptualized not as an enhancement of autonomy but as a process of enriching a common foundation with others. Second, in the pedagogy of mourning, the ethics of education are directed toward others rather than within the subject. Mourning is an “other-centered” ethic that makes lives livable. Education is based on the ethical foundation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and ethics can be maintained by reflecting on the uninterpretability of others. Third, while cruel optimism promises a “good life for individuals,” the pedagogy of mourning suggests “living together” as the future of education. The pedagogy of mourning includes practice: participating in criticism and resistance against the structure of bio politics, restoring an affective life based on interdependent care, and listening to the pain and death of others through media and cultural translation. Based on mourning, a democratic educational community for cohabitation can be built. The pedagogy of mourning is an education to restore the collapsed and exhausted lives of modern society and to revive the values of neglected affection such as sadness, pain, and fear. In addition, this is an aspect of democratic education that ultimately seeks to “live together.” It is only through reflecting on a life that cannot be mourned that one can find the original meaning of education.
Can an educated person mourn death? This study reflects on education imbued with an egocentrism that ignores the death of others and searches for a pedagogy of mourning as an alternative. Under neoliberal conditions, education is preoccupied with self...
Can an educated person mourn death? This study reflects on education imbued with an egocentrism that ignores the death of others and searches for a pedagogy of mourning as an alternative. Under neoliberal conditions, education is preoccupied with self-actualization and economic competence while avoiding essential vulnerabilities in life such as sadness, fear, and lethargy. Although the death of the other is an event that shows a crisis of community life, it is treated as a personal and marginal problem in education. This study starts from the point of view that faithfully mourning others is the ethics that education must pursue. For discussion, this study referred to the mourning theory of Judith Butler, who contemplated solidarity and political advocacy for the weak against hatred and violence. This study first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eoliberal education and mourning. Neoliberal education refers to an educational ideology that translates all educational activities into future economic values rather than referring to specific educational content. Neoliberal education encourages a positive and autonomous idea of subjectivity and idolizes the principle of meritocracy, which justifies rewards for competence. However, within that structure, the educated subjects experience psychological crises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exhaustion rather than enjoying the promised good life. The study explains the impact of neoliberal education on the minds of subjects through the concept of “cruel optimism.” Neoliberal students believe that they can reach a good future through education, and as a result, they obsessively carry out orders for self-growth. Personal growth and economic usefulness constitute the ethics of education today. But the optimism of education is cruel because the good future promised by education is uncertain, and the process of reaching it is all exhausting. Cruel optimism is a condition that makes mourning difficult because people who fall into it do not accept the loss of the object and try to maintain attachment to the object. To overcome the overall limits of education, this study attempts to rethink the ethics of education as related to mourning. For this, I referred to the post-structural philosopher Judith Butler(1956–), who widely discussed the conditions of mourning and political ethics. There are two questions asked by Butler. First, what conditions must be present for the subject to mourn the other? If self-centeredness makes mourning difficult, a new understanding of the subject is required to perform faithful mourning. Modern subjects are independent and autonomous beings. Butler overthrew the essentialist subject by understanding biological sex as a product of gender norms. According to Butler, the subject exists by performing discourse, and repetitive performance produces agency. In other words, the subject exists in a state of being obsessed with the other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and practices ethics through performance rather than autonomy. This is the subject's condition for mourning the death of the other.
Second, what is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ethical meaning of mourning? Butler's mourning is a concept discussed in the experiences of 9/11 and ideological interests in political ethics. Butler was interested in the lives of women and sexual minorities who were alienated from gender power in early theories, and based on this, she considered the universal ethics that could encompass various conditions of the weak, such as gender, class, race, post-colonialism, and disability. In particular, 9/11 and the wa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ethical thinking centering on mourning. This study examined the philosophical and political-ethical meanings of Butler's mourning. (1) mourning implies the ontology of other-centeredness. We feel unbearable sadness in the face of the other’s death because we exist in the way we were involved in the other from the beginning. The death of the other comes as ‘the face’, giving an irresistible ethical command to mourn. Vulnerability and precariousness in life are revealed through mourning, which serves as an ontological basis for building an ethical community. (2) mourning is a complex problem in a political-ethical context. In the real world, there are deaths that cannot be mourned, and they are dehumanized without being recognized as livable lives. Therefore, the effort to mourn the unmournable death is a practical act that gives public meaning to the lives of others. But since the oppression, pain, and death that belong to the other are an abyss that cannot be clearly captured, mourning always faces a limit. In other words, mourning is possible through its constant failure. Based on this discussion, the pedagogy of mourning was proposed against the cruel optimism of education. Education that can mourn the death of others means an alternative principle of education that reflects on education trapped in self-centered growth. The pedagogy of mourning was presented in the dimension of the subject, the other-centered ethics, and the community. First, the pedagogy of mourning breaks the boundaries of the educated subject. Mourning reveals vulnerability and precariousness in life, and the subject of mourning can escape from egocentrism through ethic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hrough this, educational growth can be reconceptualized not as an enhancement of autonomy but as a process of enriching a common foundation with others. Second, in the pedagogy of mourning, the ethics of education are directed toward others rather than within the subject. Mourning is an “other-centered” ethic that makes lives livable. Education is based on the ethical foundation of unconditional hospitality, and ethics can be maintained by reflecting on the uninterpretability of others. Third, while cruel optimism promises a “good life for individuals,” the pedagogy of mourning suggests “living together” as the future of education. The pedagogy of mourning includes practice: participating in criticism and resistance against the structure of bio politics, restoring an affective life based on interdependent care, and listening to the pain and death of others through media and cultural translation. Based on mourning, a democratic educational community for cohabitation can be built. The pedagogy of mourning is an education to restore the collapsed and exhausted lives of modern society and to revive the values of neglected affection such as sadness, pain, and fear. In addition, this is an aspect of democratic education that ultimately seeks to “live together.” It is only through reflecting on a life that cannot be mourned that one can find the original meaning of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분석 8
- 3. 연구 문제 13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선행연구 분석 8
- 3. 연구 문제 13
- II. 애도의 폐제 15
- 1. 신자유주의 주체의 특성 15
- 가. ‘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 주체 16
- 나. 주체의 자유와 불안 19
- 2. 메리토크라시와 교육의 ‘꿈’ 22
- 가. 교육과 메리토크라시 23
- 나. 교육적 ‘꿈’의 속성 28
- 3. 애도를 폐제하는 교육 31
- 가. 교육의 약속: 미래지향적 교환가치 31
- 나. 교육의 잔혹한 낙관주의 33
- III. 애도의 조건 40
- 1. 젠더화된 주체 40
- 가. 주체의 욕망: 상호인정과 타자 40
- 나. 젠더: 담론을 체현하는 몸 44
- 2. 비본질적 주체의 행위주체성 50
- 가. 비정체성의 정치와 비체 50
- 나. 몸의 수행성과 저항 54
- 다. 복종/주체화와 힘의 생성 56
- IV. 애도의 정치윤리학 60
- 1. 애도론의 배경 60
- 가. 9/11과 애도의 요청 60
- 나. 보편성과 문화번역 63
- 2. 애도의 수행: 취약성과 공거 66
- 가. 애도하는 ‘나’는 누구인가? 66
- 나. 애도를 호소하는 타자의 얼굴 70
- 다. 공거의 윤리로서 애도 75
- 3. 애도불가능성의 윤리 79
- 가. 애도와 살만한 삶 80
- 나. 애도될 수 없는 삶 82
- 다. 윤리적 폭력과 타자라는 심연 85
- V. 애도의 페다고지 92
- 1. 교육-주체 허물기 95
- 가. 교육과 담론의 폭력 95
- 나. 주체의 취약성 98
- 다. 성장의 재개념화 102
- 2. 타자를 애도하는 교육 105
- 가. 교육의 윤리적 토대로서 환대 106
- 나. 실패하는 애도와 교육의 가능성 112
- 3. 애도와 교육공동체 116
- 가. 생명정치의 구조 비판하기 116
- 나. 정동적 삶 회복하기 121
- 다. 타자의 목소리 듣기 125
- VI. 요약 및 결론 131
- 참고문헌 137
- Abstract 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