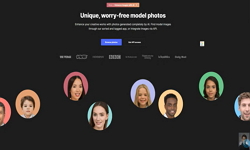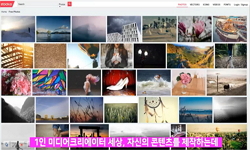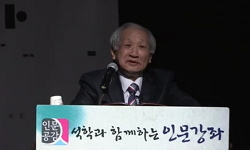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新羅 文武王 21년(681) 遺詔에 보이는 律令格式 改定令 = The Amendment of the Code of Laws in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in 681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5430838
-
저자
정병준 (동국대학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8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Shilla ; King Munmu ; Testamentary Edicts ; Sui Emperor Wen-ti ; Lü-Ling ; Ge-Shi ; 신라 ; 문무왕 ; 유조 ; 수 문제 ; 율령 ; 격식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121-160(40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In the last part of the testamentary edicts of King Munmu, which was promulgated in 681, a phrase is noteworthy that it demands corrections if there are unreasonable or inappropriate articles in the code of laws. Korean scholarship has generally read this as attesting to the completion of the code of laws at that time, which supposedly provided a ground for a series of administrative reformations that subsequently followed the completion.
The same phrase also previously appears in a document of the Sui Dynasty Emperor Wen-ti, in his testamentary edict promulgated in the seventh month in 604. However, the code of laws implemented under the regime of the Emperor Yang-ti, the successor of the Emperor Wen-ti, bears no direct connection to the Emperor Wen-ti’s edict. Seen in this light, we can assume that both the Shilla King Munmu and the Sui Emperor Wen-ti’s orders for the correction of laws were announced merely out of formality.
Kitamura Hideto(北村秀人) has denied the institution of the code of laws in Shilla while criticizing the correction order as well as clauses about administrative orders prescribed in the last part of the Munmu document as unnatural, clichéd, and too abstract as if pasted from other documents. This seems a misunderstanding on his part as the administrative orders in the Sui and Tang documents are specified in a clear and detailed fashion. On the contrary to Kitamura’s view, the correction order in the Munmu edicts must be read as precisely reflecting the reality at the time of King Munmu-presumably, in the Middle Shilla period, there were the code of laws established in anticipation of later corrections. It was a common custom at the Tang court that carried out partial corrections to law articles with an original code intact. This study examines the possibility that the similar custom was practiced by the Middle Shilla court in regard to the corrections of the code.
국문 초록 (Abstract)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
문무왕 21년(681) 7월에 반포된 遺詔의 마지막 부분에 “律令格式에 不便한 것이 있으면 즉시 改張하도록 하라”는 구절이 보인다. 이에 대해 국내 학계에서는 해당 시기에 율령격식이 완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혹은 이후에 행해진 일련의 제도 개혁의 근거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구절과 비슷한 용례를 찾아보면, 유일하게 隋 文帝 仁壽 4년(604) 7월에 반포된 遺詔가 있다. 그런데 수 문제를 이은 煬帝 시기에 반포된 律令의 편찬 상황을 살펴보면 수 문제의 유조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즉 문무왕과 수 문제 유조의 해당 구절은 법전 혹은 법제의 직접적 개정을 명했던 것이 아니라 원론적 차원에서 율령격식의 개선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北村秀人는 문무왕 유조의 마지막 부분에 서술된 국정 지시 사항들에 대해 “가져다 붙인 것처럼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강하게 들고 표현도 매우 추상적이고 간략하며 더욱이 상투적으로 보이는데, 율령격식 개정에 관한 구절도 그 하나다”라고 하면서 신라 율령격식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하지만 문무왕 유조와 비슷한 형식으로 된 수당시대 유조들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적힌 국정 지시 사항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표현 또한 명확하다. 당 태종 유조의 경우에는 그 내용들이 편찬 사서에서까지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문무왕의 유조에 보이는 율령격식 개정령 역시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당시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중대 신라에서도 개정을 전제로 한 율령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唐에서 법전 조문의 부분 수정이 상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을 참조하면 신라 중대에도 王敎에 의해 율령의 내용이 개정되거나 보완될 때 율령 법전에서 조문의 부분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왕명이 일정 정도 축적되면 이를 손질하여 격식이라는 법전을 새로 편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홍승우, "한국 고대 율령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堀敏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3 "자치통감"
4 "신당서"
5 池田溫,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6 "삼국사기"
7 "구당서"
8 윤선태, "강좌한국고대사 3" 2003
9 전봉덕, "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1 홍승우, "한국 고대 율령의 성격"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1
2 堀敏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3 "자치통감"
4 "신당서"
5 池田溫,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 2005
6 "삼국사기"
7 "구당서"
8 윤선태, "강좌한국고대사 3" 2003
9 전봉덕, "韓國法制史硏究" 서울대학교출판부 1968
10 한영화, "韓國 古代의 刑律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2
11 정병준, "韓國 古代 律令 硏究를 위한 몇 가지 提言" 동국역사문화연구소 (59) : 201-229, 2015
12 "隋書"
13 "通典"
14 律令硏究會, "譯註日本律令 6" 東京堂 1984
15 "玉海"
16 北村秀人, "日本古代史講座 7" 學生社 1982
17 大隅淸陽, "日唐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18 鈴木靖民, "日唐律令比較硏究の新段階" 山川出版社 2008
19 주보돈, "新羅時代의 連坐制" 25 : 1984
20 홍승우, "新羅律의 基本性格" 50 : 2004
21 양정석, "新羅 公式令의 王命文書樣式 考察" 15 : 1999
22 정병준, "文武王 9년(669) 赦書에 보이는 ‘五逆’의 系譜 -唐代 以前 赦書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7) : 245-282, 2017
23 "文心雕龍"
24 高明士, "律令法與天下法" 上海古籍出版社 2013
25 堀敏一,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私の中國史學(二)" 汲古書院 1994
26 堀敏一, "律令制と東アジア世界" 汲古書院 1994
27 武田幸男, "岩波講座世界歷史 6" 岩波書店 1971
28 "唐會要"
29 劉俊文, "唐律疏議箋解" 中華書局 1996
30 岳純之, "唐律疏議" 上海古籍出版社 2013
31 劉俊文, "唐律疏議" 中華書局 1993
32 "唐大詔令集"
33 "唐六典"
34 池田溫, "唐令拾遺補" 東京大學出版會 1997
35 仁井田陞, "唐令拾遺" 東京大學出版會 1933
36 中村裕一, "唐代制勅硏究" 汲古書院 1991
37 우성민, "唐代 율령을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와 상호 인식 - 唐代 關市令을 중심으로 -" 효원사학회 48 : 195-241, 2015
38 류준형, "唐代 王言文書의 전달과 中使의 활동" 동양사학회 (141) : 129-172, 2017
39 戴建國, "唐代 令文의 部分 修正 및 補充" 19 : 2015
40 "北史"
41 "冊府元龜"
42 程樹德, "九朝律考 4" 세창출판사 2015
43 정병준, "(번역논문)法典編纂의 歷史(4) -隋 및 唐 前期-(滋賀秀三)" 신라사학회 (39) : 189-209, 2017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三國志』 東夷傳에 나타난 대민지배방식과 民·下戶의 성격
- 한국고대사학회
- 나유정
- 2018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학회
- 김근영
- 2018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학회
- 이강래
- 2018
- KCI등재
-
- 한국고대사학회
- 강나리
- 2018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7-0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 Ancient Historical Association -> The Society for Ancient Korean History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9 | 1.69 | 1.8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4 | 1.57 | 3.463 | 0.17 |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