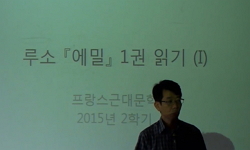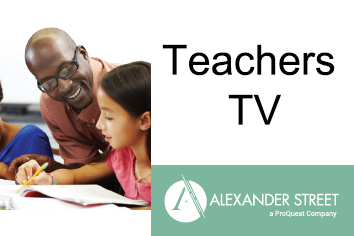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근대계몽기 서사물들의 사실/허구 관념에 대한 탐구(1장), 최남선의 ‘경험적’ 글쓰기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규명(2장), 이광수가 근대 ‘문학’ 관념...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근대 문학 형성과정에서 허구/사실/진리의 위상 변화 연구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G3790410
- 저자
-
발행기관
-
-
발행연도
2010년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사실 ; fact ; modern literature ; history ; Yi Gwangsu ; experiential wrigting ; fiction ; Kim Dongin ; Choi Namsun ; truth ; 허구 ; 진리 ; 서사 ; 근대문학 ; 최남선 ; 이광수 ; 김동인
-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근대계몽기 서사물들의 사실/허구 관념에 대한 탐구(1장), 최남선의 ‘경험적’ 글쓰기 문학사적 위치에 대한 규명(2장), 이광수가 근대 ‘문학’ 관념을 구성하면서 사실/허구의 지위가 극적으로 전도되고 ‘일신상의 진리’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양상에 대한 규명(3장), 마지막으로 김동인의 문학 창작론에서 예술적 ‘창조(허구)’가 ‘현실’과의 연결 고리를 끊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과정에 대한 규명(4장)이 그것이다.
1장은 근대 계몽기의 여러 서사 텍스트들에서 전통적인 역사와 허구의 경계가 동요하고 뒤섞이는 복잡한 양상을 규명할 것이다. 근대계몽기의 서사(‘소설’)들은 저마다 ‘사실(事實)’을 기록한다는 의식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사실’의 함의란 제각각이었다. ‘역사ㆍ전기소설’의 작가들에게 ‘사실’은 국가의 공공성과 관련된 ‘史實’로서의 의미가 컸다면, 신소설 작가들에게 ‘사실’이란 무엇보다 현재의 ‘풍속세태’였다. ‘사실’의 함의가 다른 만큼, 그 ‘사실’의 대립항인 ‘허구’의 범주 또한 같을 수 없었다. 그러나 매우 이질적인 듯이 보이는 근대계몽기의 서사가 공통적으로 드러내는 바는 ‘實’(현실)에 대한 의지였으며, 이를 드러내기 위한 각각의 장치들을 고안해냈다. 서사적 논설은 서술된 이야기가 ‘事實’임을 강조하기 위해 항시 그것이 당사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임을 강조했으며, 사실임을 믿기 어려운 환상적인 장면들은 반드시 ‘꿈’이라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간접화시켰다. ‘역사, 전기소설’은 국가의 운명과 관계된 公共性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나름의 ‘史實’을 구축해갔다. 반면 신소설은 공공성과는 무관한 풍속세태의 재현, 즉 ‘寫實’을 통해 전대 문학과 다른 자신의 ‘새로움(新)’을 입증하고자 했다. 이처럼 근대계몽기 서사들이 제각기 ‘현실’의 어떤 측면에 뿌리내리고자 했을 때, 아직 허구/사실을 분리하고 문학적 서사를 기본적으로 ‘허구’, 즉 상상의 산물이라고 보는 의식은 공유되어 있지 않았으며, ‘허구’(픽션)는 한갓 허탄무거한 이야기라는 부정적인 함의에 머물러 있었다.
2장은 최남선이 소년지에서 시도하고 있는 근대적 ‘글쓰기’, 특히 일련의 ‘경험’적 글쓰기가 ‘경험된 사실’이라는 관념을 도입함으로써 ‘허구’로서의 근대 ‘문학’ 형성 과정을 역설적으로 매개하고 있음을 규명할 것이다. 최남선이 도입한 ‘경험된 사실’이라는 관념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근대 ‘문학’ 형성을 매개하고 있다. 일기, 기행, 편지 등의 ‘경험’적 글쓰기는 여전히 ‘사실’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허구’로서의 근대 문학 형성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주변화될 운명에 놓여 있다. 하지만 ‘경험’의 강조는 그 ‘경험’의 주체인 ‘나/자기’를 전제함으로써 ‘일신상의 진리’라는 개념을 향한 길을 열어 놓는다. ‘나/자기’의 관념은 일체의 인식과 판단의 중심인 근대적 ‘개인 주체’의 탄생을 알리며, ‘사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담지하는 ‘문학’이라는 관념도 ‘나/자기’를 근거로 한 것이다. 진리란 과거처럼 완성된 교리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어야 한다는 의식, 그리고 허구로서의 문학이란 바로 그 인생 자체를 재현함으로써 ‘일신상의 진리’를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four parts: notion of fact/fic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1), Choi Namsun's 'experiential writing'(2), Yi Gwangsu's notion of modern literature(3), and Kim Dongin's notion of autonomous literature(4). In the first...
This research is composed of four parts: notion of fact/fiction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1), Choi Namsun's 'experiential writing'(2), Yi Gwangsu's notion of modern literature(3), and Kim Dongin's notion of autonomous literature(4). In the first part, we inspect the complex aspects that the traditional borders between 'history'(史) and 'fiction' were eroded during the Enlightenment Period. Various types of narratives including 'new novel', 'historical-biological novel', and 'narrative discourse' have the will to 'facts' in common although they have different viewpoint on what are facts and what are fictions. Choi Namsun's ‘experiential writing' also succeeded to such will to 'facts', focusing on documenting an individual's proper experience. However, Choi's focus on the individual subject paradoxically led to the 'individual truth', which notion could be fully established by Yi Gwangsu. In Yi Gwangsu's notion of modern literature, the hierarchy of fact/fiction was so dramatically inversed that novel as fiction can have some privilige to quest for the truth. Finally, Kim Dongin's extreme focus on 'creation' severed the relation between novels and facts, upgrading novelists to the position of 'G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