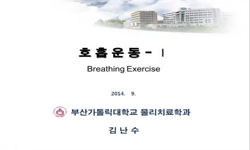The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doesn't have legal force. It can be recognized the proposed bill because of military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But in that case,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ism. If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is regard...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3600931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485-510(26쪽)
-
KCI 피인용횟수
3
- 제공처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re is no reason why the conditions are same between emergency order and mobilization because their purposes are different. The President can exercise the legislative power in case of emergency, on the other hand, mobilization is regulated recalling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The emergency order can cover the condition of mobilization, but inverse case, it is incorrect to relax the regulation of emergency power. In that case, it can be solved by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s regard of the matter of martial law, we have to analysis rigorously “case of wartime,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when the situation has been occurred exactly. Therefore, if we want to prevent any war damages, the mobilization has to be proclaimed more urgent than wartime proclamation not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The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doesn't have legal force. It can be recognized the proposed bill because of military needs for emergency situation. But in that case, it is against the constitutionalism. If War Readiness Reserve Act(Bill) is regarded as important matter and must be implied by the act, it should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Because the Mobilization limit the common rights and assign the duty to citizens, it is worth to acknowledge the details to citizen although the information is classified by military purposes. That’s the reason why the mobilization general law must be regulated.
There is no reason why the conditions are same between emergency order and mobilization because their purposes are different. The President can exercise the legislative power in case of emergency, on the other hand, mobilization is regulated recalling manpower and material resources. The emergency order can cover the condition of mobilization, but inverse case, it is incorrect to relax the regulation of emergency power. In that case, it can be solved by National assembly’s legislation. As regard of the matter of martial law, we have to analysis rigorously “case of wartime,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when the situation has been occurred exactly. Therefore, if we want to prevent any war damages, the mobilization has to be proclaimed more urgent than wartime proclamation not in time of war, armed conflict or similar national emergency.
국문 초록 (Abstract)
동원의 선포요건이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원의 선포요건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동원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같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도 없다. 동원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원의 요건도 당연히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동원기본법」을 제정하여 동원에 대한 통일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전시대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원기본법」에서 동원의 선포요건을 정한다고 할 때,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전시 이전에 동원을 해야 한다는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동원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동원제도에서 전시대기법 및 동원의 선포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전시대기법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에 국회의 제출 및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하...
본 연구는 동원제도에서 전시대기법 및 동원의 선포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전시대기법은 전시를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에 국회의 제출 및 의결을 거치거나 대통령의 긴급명령을 통하여 발효될 수 있도록 평시에 행정부 내에서 준비해 놓은 정부 법률안이다. 동원과 관계된 전시대기법에는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과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현재 물자동원에 관한 법률은 없고, 물자동원을 준비하고 자원을 관리하는 법률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전시 물자동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에도 법률안으로만 준비하고 있다가 전시에 입법절차를 거쳐서 발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전시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이러한 법률이 제대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 다른 전시대기법인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안」은 마치 법률인 것처럼 효력을 가져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는 문제점이 있다. 현행 법률에서 부분동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전시대기법을 근거로 부분동원에 대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부분동원이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원의 선포요건이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동원의 선포요건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동일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동원과 긴급명령의 요건이 같아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청도 없다. 동원은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 의무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동원의 요건도 당연히 입법자가 국가의 안보상황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동원기본법」을 제정하여 동원에 대한 통일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고, 전시대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동원기본법」에서 동원의 선포요건을 정한다고 할 때, 헌법상 긴급명령의 요건에 기속됨이 없이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면 될 것이다. 전시 이전에 동원을 해야 한다는 국방상의 필요에 따라 동원의 선포요건을 “전시․사변 및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급박한 군사상 필요가 있을 때”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송기춘, "헌법주석서 Ⅲ" 법제처 2010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5 성석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2014
6 송영근,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5
8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2004
9 박윤흔, "비상대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기획위원회 1993
10 김열수, "비상대비 관련법령 정비방안" 행정안전부 2011
1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박영사 2012
2 송기춘, "헌법주석서 Ⅲ" 법제처 2010
3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박영사 2005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6
5 성석호,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방위원회 2014
6 송영근,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방대학원, "안보관계용어집" 1995
8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2004
9 박윤흔, "비상대비관계법령의 체계적 정비방안" 국가안전보장회의비상기획위원회 1993
10 김열수, "비상대비 관련법령 정비방안" 행정안전부 2011
11 병무청 홈페이지, "부분동원제도 안내"
12 국방부 홈페이지, "부분동원제도 소개"
13 법제처 홈페이지, "법령해석 사례, 헌법 제76조제2항 “중대한 교전상태”의 해석에 대한 질의"
14 국방부 홈페이지, "동원관련 법령"
15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 "독일 기본법"
16 군사학연구회, "군사학개론" 플래닛미디어 2014
17 이상철, "군사법원론" 박영사 2014
1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9 이상철, "국방행정법원론" 도서출판 봉명 2009
20 한영수,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21 길병옥, "국가비상사태 대비 ‘국가위기대응법’제정방안에 관한 논고" 한국군사학회 (64) : 2010
22 국방부 홈페이지, "국가동원의 필요성"
23 김도창, "국가긴급권론" 청운사 1972
24 문순영, "국가 징발제도 발전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3
25 이상철, "계엄법에 관한 문제점 고찰" 안암법학회 12 : 2001
26 국방일보, "2015. 9. 3.자 기사"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공법학회
- 홍완식
- 2016
- KCI등재
-
초헌법적 국가긴급권에 대한 위헌심사 연구 - 헌법재판소 2015. 3. 26. 2014헌가5 결정을 중심으로 -
- 한국공법학회
- 승이도
- 2016
- KCI등재
-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쟁점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온라인에서의 적의적 표현행위(Hate Speech)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 한국공법학회
- 조소영
- 2016
- KCI등재
-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법적 고찰 - 교권보호를 중심으로 -
- 한국공법학회
- 김수홍
- 2016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8 | 1.08 | 1.06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4 | 0.96 | 1.025 | 0.31 |




 DBpia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