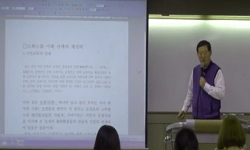Manboksa-jeopo-gi(萬福寺樗蒲記) and Yiseng-guijang-jeon(李生窺墻傳), which are two tragedies of Geumoh-sinhwa(金鰲新話), provide the tragic points of view with lessons in the soft, slow and lyrical way, regardless of the Buddhist colors...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금오신화』로 본 한국애정비극의 특성 -동아시아적 사유와 서양적 사유의 차이를 중심으로- = Characteristics of Korean Love Tragedies by Studying Geumoh-sinhwa -based o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Oriental and the Western reasons-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A103964847
-
저자
김창현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0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비극 ; 금오신화 ; 만복사저포기 ; 이생규장전 ; 오이디푸스왕 ; Tragedy ; Geumo-sinhwa ; Manboksa-jeopo-gi ; Yiseng-guijang-jeon ; Oedipus the King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39-54(16쪽)
-
KCI 피인용횟수
6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cluding method of Yiseng-guijang-je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tragedies well. Lee Saeng who cannot take the reality of his wife's death and dies at the end provides an extremely strong image.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tendency of the author who highly valued fidelity as one of the six loyal courtiers.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s loyalty towards the deceased king is contained in this novel. As a result, the cause of the powerfulness can be found from the sorrowful indignation.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tragedy of the sorrowful indignation by combining fidelity with affection. There are so many tales about men and women dying of lovesickness. Looking at the resentment related with love and the earnest love of the lumberjack who never forgets his love after becoming a rooster, we can find the complete model for Korean tragedies in this novel.
Manboksa-jeopo-gi(萬福寺樗蒲記) and Yiseng-guijang-jeon(李生窺墻傳), which are two tragedies of Geumoh-sinhwa(金鰲新話), provide the tragic points of view with lessons in the soft, slow and lyrical way, regardless of the Buddhist colors. Such a style represents the esthetic characteristic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he Western tragedy which makes people realize their own egos through the intense ends. It starts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ental point of view, which values the universal world containing the existence of God fundamentally identical as the ego of humans, and the Western point of view which considers humans as those suffering from their own destiny before God. Because of this, the man of strong will, who wants to become dignified before God and himself by accepting his destiny and protecting his internal nobility, is in the center of tragedies in the Western world. This is the compromise between the destiny affection and the tragic resistant spirit. Oedipus overcame his destiny and protected his legitimacy through the oracle that the country where his tomb was located would flourish.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or humans and the universe is in the center of tragedies in Korea. Because of this, there are many love tragedies. The affection or fidelity among individuals sometimes even puts off the universal order.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for the character in the novel to keep living with his deceased lover as if she were alive. It reflects the possibility that one’s earnest wish can be communicated with the universal power. However, there is a limit for putting off the universal order. It is inevitable for individuals to have ontological limits in the vast universe. Therefore, tragedies become possible. The ‘Destiny Affection’ which is shown in the Korean tragedies reflects the fact that the universe and humans share a fundamental identity. However, such a fact does not establish tragedies by itself. The resistant spirit of the Korean affection-oriented tragedies shows that lovers do not give up their affection for each other until they die. While Manboksa-jeopo-gi plans the Buddhist conquest, it shows a solitary conclusion that the character in the novel does not get married and disappears in the end. Such a conclusion provides the readers with a long lingering image as well as fundamental questions about life and love.
The concluding method of Yiseng-guijang-jeon represents th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tragedies well. Lee Saeng who cannot take the reality of his wife's death and dies at the end provides an extremely strong image. Th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tendency of the author who highly valued fidelity as one of the six loyal courtiers. It can be said that the author's loyalty towards the deceased king is contained in this novel. As a result, the cause of the powerfulness can be found from the sorrowful indignation. It is possible to emphasize the tragedy of the sorrowful indignation by combining fidelity with affection. There are so many tales about men and women dying of lovesickness. Looking at the resentment related with love and the earnest love of the lumberjack who never forgets his love after becoming a rooster, we can find the complete model for Korean tragedies in this novel.
국문 초록 (Abstract)
특히 <이생규장전>의 결말방식은 한국비극의 한 특징적인 모습이 잘 정련된 양상이다. 아내와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죽는 이생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다. 이것은 생육신(生六臣)으로서 의리를 중시한 작가의 기질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죽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이 담겨있다고 보면 이 강렬함의 원인을 비분강개에서 찾을 수 있다. 의(義)에 정(情)이 개입함으로써 비분강개의 비극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상사병(相思病)으로 죽는 남녀에 대한 무수한 설화들이 있다. 상사뱀의 걸쭉한 한과 수탉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나무꾼의 간절한 원망을 넘어,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적인 비극의 완성된 전형을 본다.
『금오신화』의 두 비극,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불교적 색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드럽고 느리며 매우 서정적인 방식으로 비극적 세계관을 환기시키고 깨달음을 준다. ...
『금오신화』의 두 비극,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은 불교적 색채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드럽고 느리며 매우 서정적인 방식으로 비극적 세계관을 환기시키고 깨달음을 준다. 이것은 격렬한 파국을 통해 인간을 자기 존재에 접하도록 하는 서양 비극과는 크게 다른 미적 특성이다. 이것은 신적인 존재를 포함한 세계와 인간 자신인 자아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는 동아시아적 사유와 인간을 신과 운명 앞에 내던져진 존재로 인식하는 서양적 사유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때문에 서양에서는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자기 내면의 고귀함을 지킴으로써 신과 자신 앞에 당당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적인 인간이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것이 운명애와 비극적 저항정신의 타협이다. 오이디푸스는 그의 무덤이 있는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는 신탁을 통해 결국 운명(신탁)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당성을 지켜낸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우주자연의 ‘관계’가 비극의 중심에 있었다. 이 때문에 애정비극이 많이 나타난다. 개인들이 서로 품은 정과 의리는 때로 우주질서마저 유보시킨다. 죽은 연인과 살아있을 때와 꼭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절실한 원망(願望)이 우주자연의 힘과 소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주질서의 유보에는 한계가 있다. 거대한 우주 안에서 개인은존재론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극이 가능해진다. 한국 비극의 ‘운명애’는 결국 우주와 인간의 본질적 동일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비극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한국 애정비극의 저항정신은 연인들이 끝내 서로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복사저포기>가 불교적 초극을 기획하지만 그 주인공이 끝내 결혼하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쓸쓸한 결말은 독자들에게 긴 여운과 함께 인생과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특히 <이생규장전>의 결말방식은 한국비극의 한 특징적인 모습이 잘 정련된 양상이다. 아내와의 이별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해 죽는 이생의 모습은 매우 강렬하다. 이것은 생육신(生六臣)으로서 의리를 중시한 작가의 기질과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 죽은 임금에 대한 작가의 충정이 담겨있다고 보면 이 강렬함의 원인을 비분강개에서 찾을 수 있다. 의(義)에 정(情)이 개입함으로써 비분강개의 비극성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한국에는 상사병(相思病)으로 죽는 남녀에 대한 무수한 설화들이 있다. 상사뱀의 걸쭉한 한과 수탉이 되어서도 잊을 수 없는 나무꾼의 간절한 원망을 넘어, 우리는 여기에서 한국적인 비극의 완성된 전형을 본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현, "梁山璹傳의 비극성 연구 조선시대 상층영웅비극의 미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온지학회 16 (16): 73-102, 2007
2 Williams, R., "현대비극론" 학민사 1985
3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4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일지사 1993
5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6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32 : 1975
7 김창현, "이원성 극복의 두 양상: 비극과 서사무가" 한국비교문학회 (42) : 5-28, 2007
8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in: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9 김용덕, "이생규장전 연구. in: 한국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10 최숙인, "이생규장전 연구" 3 : 1980
1 김창현, "梁山璹傳의 비극성 연구 조선시대 상층영웅비극의 미학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온지학회 16 (16): 73-102, 2007
2 Williams, R., "현대비극론" 학민사 1985
3 김학성, "한국고전시가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5
4 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일지사 1993
5 주왕산,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6 지준모, "전기소설의 효시는 신라에 있다" 32 : 1975
7 김창현, "이원성 극복의 두 양상: 비극과 서사무가" 한국비교문학회 (42) : 5-28, 2007
8 설성경, "이생규장전의 구조와 의미. in: 고소설의 구조와 의미" 새문사 1986
9 김용덕, "이생규장전 연구. in: 한국문학탐구" 민족문화사 1983
10 최숙인, "이생규장전 연구" 3 : 1980
11 김창현, "영웅좌절담류 비극소설의 특징과 계보 파악을 위한 시론" 동아시아고대학회 (13) : 81-112, 2006
12 채연식, "애정류 전기소설 연구-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2000
13 Aristotle, "시학" 고려대 출판부 1983
14 Sophocles, "소포클레스 비극"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15 Nietzsche, F., "비극의 기원" 범우사 1995
16 Jaspers, K., "비극론·인간론" 범우사 1999
17 Corrigan, Robert Willoughby, "비극과 희극, 그 의미와 형식"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18 조동일, "미적범주" 1973
19 이대규,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해석" 1989
20 임형택, "나말여초의 전기문학" 5 : 1981
21 최삼룡, "금오신화의 비극성에 대한 초월의 문제" 22 : 1981
22 김명순, "금오신화의 비극성. in: 우전 신호열선생 고희기념논총" 창작과 비평사 1983
23 김창현, "<만복사저포기>에 나타난 불교와 비극성의 초극" 불교문화연구원 (44) : 247-265, 2006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카자흐스탄의 재계 현황과 재계 엘리트의 특징:정치권력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황영삼
- 2010
- KCI등재
-
Pitting One Minority Against Another:Black Korean Conflict during the 1992 L.A. Riots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주정숙
- 2010
- KCI등재
-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강철구
- 2010
- KCI등재
-
China's Transitional Financial System:Evidence from the Growing Role ofFinancial Markets
-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 윤일현
- 2010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10-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
| 2019-04-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The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  |
| 2013-12-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nal of Asia-Pacific Studies |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9-06-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아시아 태평양지역연구원 -> 국제지역연구원영문명 : Center for Asia-Pacific Studies -> Institute of Global Affairs |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6 | 0.76 | 0.77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6 | 0.73 | 1.093 | 0.23 |




 RISS
RISS 스콜라
스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