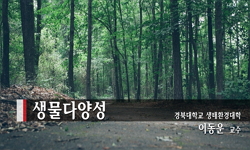데리다는 철학의 해체를 자기 철학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가 보기에, 지금까지 철학은 다양한 것들을 동일성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과제를 짊...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712511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8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166.8 판사항(4)
-
DDC
100 판사항(20)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 75p. ; 26cm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70-72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한편으로, 철학은 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철학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타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은 자신과 대립되는 타자를 철학으로 포섭함으로써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대립되는 타자를 자신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철학은 자신의 내면에 속하는 항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타자의 내면에 속하는 항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철학의 타자는 이제 철학과 적대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한갓 철학의 부정적인 형태로 이해됨으로써 철학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의 차이로 인해서 타자는 철학으로 포섭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흔적이 바로 통일성을 지향하는 철학의 기획을 한계 짓는다. 이 흔적을 찾아줌으로써 데리다는 철학의 자기 중심적인 체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의 장소는 철학의 '내면'이다. 데리다가 철학의 해체를 철학 내부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철학적이지 않은 타자를 철학적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철학은 이미 그 한계 안에서 타자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철학에 내면적인 해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학 텍스트들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철학 텍스트가 텍스트의 이종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 그리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읽기를 추구할 수 있는 지점에서 텍스트에 침입함으로써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는다. 플라톤의 『파이드 로스』의 경우 이러한 지점을 형성하는 것은 '파르마콘'이다. 파르마콘은 철학의 이항 대립적인, 따라서 궁극적으로 통일적인 법칙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파르마콘에는 독과 약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두 의미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논리는 파르마콘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대립되는 의미를 두 가지 반대되는 어휘로 분리하여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은 독과 약의 한가지를 다른 한 가지에 대립시키고 이 중의 한 가지를 선호하여 다른 한가지를 제외시키는 결정을 취한다.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르마콘은 플라톤의 결정에 따라 약이 아닌 독이거나 혹은 독이 아닌 약의 일의적인 개념으로 번역되고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파이드로스』는 일관된 철학적 읽기를 확보한다.
데리다는 파르마콘이 약이 아닌 독으로 혹은 독이 아닌 약으로 읽히기를 강요받고 있는 지점에서 『파이드로스』 텍스트를 다시 읽어준다. 약으로 읽히기를 강요받고 있는 파르마콘은 독으로, 독으로 번역되고 있는 파르마콘은 약으로 읽어줌으로써 『파이드로스』는 철학적인 읽기와 대응되어 읽혀진다. 이러한 대응적 읽기에서 데리다는 일단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선호도를 반전시키고 이러한 반전이 이미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데리다가 플라톤적인 대립과 통일의 구도 내에 있는 결정의 반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이러한 대립과 그것의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인 움직임에 있다.
독과 약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파르마콘은 『파이드로스』 텍스트가 두 번 읽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치 파르마콘이 독과 약 중의 어느 하나의 의미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파이드로스』는 텍스트의 두 가지 읽기 중에 어느 하나의 읽기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파르마콘이 독과 약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미결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도 두 가지 읽기에 대해서 미결정적이다. 즉 플라톤의 텍스트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중복적으로 읽힐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복적인 읽기 중 어느 하나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르마콘이 대립되는 두 의미를 미결정적으로 공존시킴으로써 대립의 긴장을 자신 안에 보유하고 있듯이 『파이드로스』는 두 가지 읽기 간의 긴장을 유지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 읽기는 파르마콘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를 포섭하거나 배제시킴으로써 대립을 해소하고, 『파이드로스』 텍스트의 중복성의 긴장을 지운다. 그러나 데리다는 독과 약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의미간의 미결정성을 통해서 파르마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듯이 서로 다른 읽기 간의 해소되지 않는 긴장과 중복성을 통해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데리다가 파르마콘을 중심으로 『파이드로스』의 해체적인 읽기를 수행하는 것은 파르마콘의 의미가 중복적으로 읽히는 것으로부터 『파이드로스』 텍스트가 가지는 중복성을 플라톤의 텍스트에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여 데리다가 읽는 텍스트의 의미는 열려진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의 무한정한 풍요나 의미론적 과잉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해석이 중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텍스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의 해체는 텍스트 이후에 텍스트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분석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차이성, 다양성을 읽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해체는 텍스트의 파괴가 아니라 텍스트의 충실한 읽기와 겹쳐진다.
데리다는 철학의 해체를 자기 철학의 과제로 삼고 있다. 그가 보기에, 지금까지 철학은 다양한 것들을 동일성 속에서 바라보려고 하였고 그것을 자신의 과제로 삼아왔다. 이러한 과제를 짊어진 철학은 두 가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철학은 무수히 다양한 것을 이항 대립의 관계로 묶는다. 두 번째 철학은 대립되는 양항을 어느 하나의 항으로 통일하려고 시도한다.
한편으로, 철학은 철학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을 철학에 속하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것을 타자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은 자신과 대립되는 타자를 철학으로 포섭함으로써 철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한다. 대립되는 타자를 자신 안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철학은 자신의 내면에 속하는 항들을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타자의 내면에 속하는 항들을 부정적인 것으로 구성한다. 철학의 타자는 이제 철학과 적대적으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한갓 철학의 부정적인 형태로 이해됨으로써 철학으로 포섭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과의 차이로 인해서 타자는 철학으로 포섭되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이 흔적이 바로 통일성을 지향하는 철학의 기획을 한계 짓는다. 이 흔적을 찾아줌으로써 데리다는 철학의 자기 중심적인 체계를 해체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체의 장소는 철학의 '내면'이다. 데리다가 철학의 해체를 철학 내부에서 수행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철학적이지 않은 타자를 철학적으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고 두 번째 철학은 이미 그 한계 안에서 타자의 흔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리다는 철학에 내면적인 해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철학 텍스트들을 해체하려고 시도한다. 그는 철학 텍스트가 텍스트의 이종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지점, 그리고 그로부터 텍스트를 통한 다양한 읽기를 추구할 수 있는 지점에서 텍스트에 침입함으로써 텍스트를 능동적으로 읽는다. 플라톤의 『파이드 로스』의 경우 이러한 지점을 형성하는 것은 '파르마콘'이다. 파르마콘은 철학의 이항 대립적인, 따라서 궁극적으로 통일적인 법칙으로 포섭되지 않는다. 파르마콘에는 독과 약이라고 하는 대립적인 두 의미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의 논리는 파르마콘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대립되는 의미를 두 가지 반대되는 어휘로 분리하여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 『파이드로스』에서 플라톤은 독과 약의 한가지를 다른 한 가지에 대립시키고 이 중의 한 가지를 선호하여 다른 한가지를 제외시키는 결정을 취한다. 따라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르마콘은 플라톤의 결정에 따라 약이 아닌 독이거나 혹은 독이 아닌 약의 일의적인 개념으로 번역되고 이러한 번역을 통해서 『파이드로스』는 일관된 철학적 읽기를 확보한다.
데리다는 파르마콘이 약이 아닌 독으로 혹은 독이 아닌 약으로 읽히기를 강요받고 있는 지점에서 『파이드로스』 텍스트를 다시 읽어준다. 약으로 읽히기를 강요받고 있는 파르마콘은 독으로, 독으로 번역되고 있는 파르마콘은 약으로 읽어줌으로써 『파이드로스』는 철학적인 읽기와 대응되어 읽혀진다. 이러한 대응적 읽기에서 데리다는 일단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선호도를 반전시키고 이러한 반전이 이미 플라톤의 텍스트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러나 데리다가 플라톤적인 대립과 통일의 구도 내에 있는 결정의 반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의 관심은 이러한 대립과 그것의 반전을 가능하게 하는 이중적인 움직임에 있다.
독과 약의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보유하고 있는 파르마콘은 『파이드로스』 텍스트가 두 번 읽히도록 한다. 그리고 마치 파르마콘이 독과 약 중의 어느 하나의 의미를 선택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할 수 없는 것과 같이 『파이드로스』는 텍스트의 두 가지 읽기 중에 어느 하나의 읽기를 선택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 파르마콘이 독과 약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미결정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톤의 파이드로스도 두 가지 읽기에 대해서 미결정적이다. 즉 플라톤의 텍스트는 그 자체 안에 이미 중복적으로 읽힐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복적인 읽기 중 어느 하나만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다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파르마콘이 대립되는 두 의미를 미결정적으로 공존시킴으로써 대립의 긴장을 자신 안에 보유하고 있듯이 『파이드로스』는 두 가지 읽기 간의 긴장을 유지한다. 그런데 전통적인 책 읽기는 파르마콘의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어느 하나에 우월성을 부여하고 다른 하나를 포섭하거나 배제시킴으로써 대립을 해소하고, 『파이드로스』 텍스트의 중복성의 긴장을 지운다. 그러나 데리다는 독과 약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의미간의 미결정성을 통해서 파르마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듯이 서로 다른 읽기 간의 해소되지 않는 긴장과 중복성을 통해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길을 제시한다. 따라서 데리다가 파르마콘을 중심으로 『파이드로스』의 해체적인 읽기를 수행하는 것은 파르마콘의 의미가 중복적으로 읽히는 것으로부터 『파이드로스』 텍스트가 가지는 중복성을 플라톤의 텍스트에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하여 데리다가 읽는 텍스트의 의미는 열려진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의 무한정한 풍요나 의미론적 과잉의 초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해석이 중복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텍스트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텍스트의 해체는 텍스트 이후에 텍스트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분석이 아니라 텍스트 내부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차이성, 다양성을 읽어내는 일이다. 그러므로 텍스트의 해체는 텍스트의 파괴가 아니라 텍스트의 충실한 읽기와 겹쳐진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one hand, philosophy classifies what philosophy can determine as what belongs to philosophy and what philosophy cannot as to the Other. On the other hand, philosophy attempts to interpret the Other philosophically. To encompass the Other, philosophy constructs itself with the positive terms and the Other with the negative ones. The Other, therefore, becomes from the absolute contradiction to the negation of philosophy; the Other is taken into philosophy. Although the Other is encompassed, it leaves its trac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the Other itself. These traces themselves limit philosophy's intention of the unification. Derrida deconstructs the self-centered structure of philosophy, tracking these traces.
Demda's deconstruction is internal to philosophy. There are two reasons of the internal deconstruction.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non-philosophical Other cannot be posited philosophically, and the other is that philosophy holds the traces of the Other within its limit.
Demda deconstructs the existing philosophy texts in order to perform the internal deconstruction. He actively reads the texts, breaking into the texts at the very point that texts should accept their manifoldness: the point through which texts can be read diversely. In case of Plato's Phaedrus, it is 'pharmakon' that forms this point. 'Pharmakon' does not belong to philosophy's dichotomous and fundamentally unifying principle. It is because 'pharmakon' has two opposite meanings. : poison and medicine. Thus, the logic of philosophy demands dividing two opposite meanings in 'pharmakon' into two separate words. Plato, in Phaedrus, makes poison and medicine contradict each other, prefers either poison or medicine to the other and excludes the other. Therefore, 'pharmakon' in Phaedrus is interpreted not as an equivocal word but as a univocal concept, either a poison which is not a medicine or vice versa. Through this interpretation, Phaedrus wins the consistent way of philosophical reading.
Derrida rereads Phaedrus at the point where 'pharmakon' is forced to be read as a univocal concept, either poison or medicine. He confronts philosophical reading with deconstructive one, rereading 'pharmakon' which is compelled to mean poison as medicine or vice versa. In this deconstructive reading, for the moment Derrida inverses Plato's preference and suggests that this inversion is already in act in Plato's text. However, Demda does not concern only inversing Plato's decision made in dichotomizing and unifying structure. It is rather that Demda is interested in text's twofoldness which makes both Plato's preference and inversion of his preference possible.
'Pharmakon' which means both poison and medicine lets Phaedrus read in double ways. Phaedrus can neither choose nor exclude one way of reading just as 'pharmakon' can neither choose nor exclude one of its dual meanings; Phaedrus is indecisive between two ways of reading as 'pharmakon' is. In other words, Phaedrus already has the possibility of two ways of interpretation in itself and should accept those two ways. However, traditional philosophical reading gives superiority to one of two readings and excludes the other. On the contrary, Derrida suggests the way to approach the text through the unsolvable tension between two distinctive readings. Therefore, the reason that Demda performs deconstructive reading of Phaedrus is to engrave twofoldness of the text into Plato's text.
The meaning of the text Derrida reads comes to open. However, it does not mean the absolute openness of text reading. It is because Demda's text reading is thoroughly based on the text itself, even though text can be read in diverse ways. That is to say, deconstruction of the text is not analysis which is exterior to the text, but reading diversity which is interior to the text. Therefore, deconstruction of text is reading the text impartially, not dismantling the text.
Derrida sets deconstructing of philosophy as a mission of his philosophy. In his point of view, hitherto philosophy has been trying to see various objects in the identity, which philosophy has set as its goal. The philosophy with this goal has two cha...
Derrida sets deconstructing of philosophy as a mission of his philosophy. In his point of view, hitherto philosophy has been trying to see various objects in the identity, which philosophy has set as its goal. The philosophy with this goal has two characteristics. First, philosophy dichotomizes manifolds. Secondly, philosophy synthesizes dichotomous terms into one of them.
On the one hand, philosophy classifies what philosophy can determine as what belongs to philosophy and what philosophy cannot as to the Other. On the other hand, philosophy attempts to interpret the Other philosophically. To encompass the Other, philosophy constructs itself with the positive terms and the Other with the negative ones. The Other, therefore, becomes from the absolute contradiction to the negation of philosophy; the Other is taken into philosophy. Although the Other is encompassed, it leaves its trace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philosophy and the Other itself. These traces themselves limit philosophy's intention of the unification. Derrida deconstructs the self-centered structure of philosophy, tracking these traces.
Demda's deconstruction is internal to philosophy. There are two reasons of the internal deconstruction.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non-philosophical Other cannot be posited philosophically, and the other is that philosophy holds the traces of the Other within its limit.
Demda deconstructs the existing philosophy texts in order to perform the internal deconstruction. He actively reads the texts, breaking into the texts at the very point that texts should accept their manifoldness: the point through which texts can be read diversely. In case of Plato's Phaedrus, it is 'pharmakon' that forms this point. 'Pharmakon' does not belong to philosophy's dichotomous and fundamentally unifying principle. It is because 'pharmakon' has two opposite meanings. : poison and medicine. Thus, the logic of philosophy demands dividing two opposite meanings in 'pharmakon' into two separate words. Plato, in Phaedrus, makes poison and medicine contradict each other, prefers either poison or medicine to the other and excludes the other. Therefore, 'pharmakon' in Phaedrus is interpreted not as an equivocal word but as a univocal concept, either a poison which is not a medicine or vice versa. Through this interpretation, Phaedrus wins the consistent way of philosophical reading.
Derrida rereads Phaedrus at the point where 'pharmakon' is forced to be read as a univocal concept, either poison or medicine. He confronts philosophical reading with deconstructive one, rereading 'pharmakon' which is compelled to mean poison as medicine or vice versa. In this deconstructive reading, for the moment Derrida inverses Plato's preference and suggests that this inversion is already in act in Plato's text. However, Demda does not concern only inversing Plato's decision made in dichotomizing and unifying structure. It is rather that Demda is interested in text's twofoldness which makes both Plato's preference and inversion of his preference possible.
'Pharmakon' which means both poison and medicine lets Phaedrus read in double ways. Phaedrus can neither choose nor exclude one way of reading just as 'pharmakon' can neither choose nor exclude one of its dual meanings; Phaedrus is indecisive between two ways of reading as 'pharmakon' is. In other words, Phaedrus already has the possibility of two ways of interpretation in itself and should accept those two ways. However, traditional philosophical reading gives superiority to one of two readings and excludes the other. On the contrary, Derrida suggests the way to approach the text through the unsolvable tension between two distinctive readings. Therefore, the reason that Demda performs deconstructive reading of Phaedrus is to engrave twofoldness of the text into Plato's text.
The meaning of the text Derrida reads comes to open. However, it does not mean the absolute openness of text reading. It is because Demda's text reading is thoroughly based on the text itself, even though text can be read in diverse ways. That is to say, deconstruction of the text is not analysis which is exterior to the text, but reading diversity which is interior to the text. Therefore, deconstruction of text is reading the text impartially, not dismantling the tex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ⅲ
- Ⅰ. 서론 = 1
- Ⅱ. 『파이드로스』 텍스트 해체의 배경 = 8
- 1. 텍스트와 책 = 8
- 목차 = ⅰ
- 국문요약 = ⅲ
- Ⅰ. 서론 = 1
- Ⅱ. 『파이드로스』 텍스트 해체의 배경 = 8
- 1. 텍스트와 책 = 8
- 2. 텍스트 『파이드로스』 = 17
- 1) 플라톤의 책 『파이드로스』 = 17
- 2) 텍스트 『파이드로스』 = 19
- Ⅲ. 『파이드로스』와 파르마콘 = 24
- 1. 파르마콘의 의미 복원 = 24
- 2. 『파이드로스』에서 파르마콘의 등장 = 27
- 1) 파르마콘과 신화 = 28
- 2) 파르마콘과 글쓰기 = 34
- Ⅳ. 파르마콘의 이중적 작용 = 39
- 1. 대립을 산출하는 파르마콘 = 39
- 1) 철학과 신화의 대립 = 41
- 2)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대립 = 42
- 3)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 = 45
- 4) 진리와 그럴듯함의 대립 = 47
- 2. 대립을 지우는 파르마큰 - 보충 대리 = 50
- 1) 신화의 철학에 대한 보충대리 = 53
- 2) 음성언어의 문자언어에 대한 보충 대리 = 55
- 3)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보충 대리 = 57
- 4) 그럴듯함의 진리에 대한 보충 대리 = 59
- 3. 파르마콘과 차연 = 61
- Ⅴ. 결론 = 66
- 참고문헌 = 70
- ABSTRACT =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