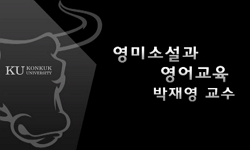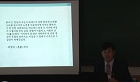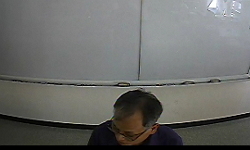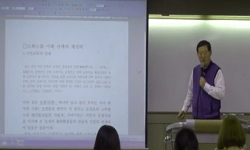윤흥길 소설의 윤리적 주체 연구 본고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윤흥길의 산업화 시대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윤리적 주체로의 이행 과정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적 주체는 상징적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윤흥길의 산업화 시대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윤리적 주체로의 이행 과정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적 주체는 상징적 질서와 단절하고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신분석학에서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가의 주요 작품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 「제식 훈련 변천 약사」, 「빙청과 심홍」의 인물들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위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개발독재 체제라는 상징적 질서에 동일시를 이룬 소시민들이었으나,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며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었던 상징적 절서의 모순과 마주한다. 각 인물의 모순에 대한 대응 양상은 냉소적 주체로 잔류할 것인지 상징적 질서의 고리를 끊는 윤리적 주체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Ⅱ장에서는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과 주체의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다룬다. 상징적 질서와의 동일시는 곧 존재의 소외를 의미한다. 이 소외 과정에서 주체는 결핍된 주체로서 드러나며 이데올로기를 일관된, 합리적인 질서라 오인한다. 이데올로기는 환상을 통해 결핍된 주체에게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관성 있는 현실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오인시킨다. 특히, 윤흥길의 소설에서 이러한 소외의 과정은 학교, 군대, 공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데 이는 산업화, 규율화를 추진한 개발독재 체제와 관련이 있다. 한편, 소외는 억압적 단계이지만 주체를 드러나게 하며 상징적 질서의 불완전함을 인지하는 ‘분리’의 발판이 된다.
‘분리’는 소외된 주체가 특정한 사건을 겪으며 완전하다고 믿었던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통해 주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의해 지탱된 오인된 현실임을 자각하고 상징적 질서와 결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별은 곧 상징적 질서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개발독재 체제의 산업화, 규율화에 동일시를 이뤄 자신의 결여를 충족하고 현실을 유지하지만, 이는 우발적 사건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질서의 불완전함과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권기용, 안순덕, 신하사 등은 상징적 질서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가로지름으로써 분리의 과정을 완수한다. 반면, 소시민적 지식인인 오석태는 상징적 질서의 결여는 인지하지만 ‘행위’는 하지 않는 냉소적 주체로 남아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일조하는 분열된 주체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Ⅲ장에서는 윤흥길 소설 속 증상적 인물과 윤리적 주체의 행위의 특성을 다룬다. 상징적 질서의 불완전함을 인지한 인물들은 그 불완전함을 상연하는 ‘행위’를 통해 윤리적 주체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질서의 작동을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체제의 적대적 인물로 낙인찍힌다. 안순덕은 공장이라는 자본주의적 공간의 모범적 노동자였으나 공장의 안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전락하고, 신하사는 군대라는 규율적 공간의 모범적 군인이었으나, 우하사라는 “채색된 영웅”을 살해하는 반역자로 낙인찍힌다.
‘행위’는 반복과 정치적 진리라는 특성을 지닌다. 주체의 행위와 주체화의 과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닌 미래의 행위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권기용은 두 번의 ‘행위’를 보여주는데, 광주 대단지에서의 실패는 권기용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지만 두 번째 행위를 통해 단순한 실패에서 두 번째 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소급적으로 부여 받는다. 즉 행위는 실패라는 결과를 마주하지만 다시 반복된 행위를 통해 소급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진리의 정치성은 보편적 진리라는 기표 속에 이미 부르주아적 편향성이 존재하기에 진정한 보편적 진리는 프롤레타리아적 주체들을 향한 편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 권기용이 동일시를 이루는 증상이 ‘철거민’, ‘빈곤 노동자’라는 점에서 권기용의 행위는 진리의 정치성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흥길의 산업화 시대의 소설은 개발독재 체제의 이데올로기 속의 주체가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억압적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개발독재 체제라는 강력한 타자를 중지시키는 주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적 인물이나 외부적 위반의 인물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모범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질서와 주체화의 핵심이 드러난다.
윤흥길 소설의 윤리적 주체 연구
본고는 정신분석의 관점에서 윤흥길의 산업화 시대 소설의 등장인물들의 윤리적 주체로의 이행 과정을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윤리적 주체는 상징적 질서와 단절하고 타자의 욕망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정신분석학에서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작가의 주요 작품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 「제식 훈련 변천 약사」, 「빙청과 심홍」의 인물들의 주체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위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개발독재 체제라는 상징적 질서에 동일시를 이룬 소시민들이었으나, 특정한 사건을 경험하며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었던 상징적 절서의 모순과 마주한다. 각 인물의 모순에 대한 대응 양상은 냉소적 주체로 잔류할 것인지 상징적 질서의 고리를 끊는 윤리적 주체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Ⅱ장에서는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의 작동 방식과 주체의 소외와 분리의 과정을 다룬다. 상징적 질서와의 동일시는 곧 존재의 소외를 의미한다. 이 소외 과정에서 주체는 결핍된 주체로서 드러나며 이데올로기를 일관된, 합리적인 질서라 오인한다. 이데올로기는 환상을 통해 결핍된 주체에게 상징적 지위를 부여하고 일관성 있는 현실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오인시킨다. 특히, 윤흥길의 소설에서 이러한 소외의 과정은 학교, 군대, 공장이라는 공간을 통해 작동하는데 이는 산업화, 규율화를 추진한 개발독재 체제와 관련이 있다. 한편, 소외는 억압적 단계이지만 주체를 드러나게 하며 상징적 질서의 불완전함을 인지하는 ‘분리’의 발판이 된다.
‘분리’는 소외된 주체가 특정한 사건을 겪으며 완전하다고 믿었던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을 깨닫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통해 주체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이데올로기의 환상에 의해 지탱된 오인된 현실임을 자각하고 상징적 질서와 결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별은 곧 상징적 질서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의 작품 속 인물들은 개발독재 체제의 산업화, 규율화에 동일시를 이뤄 자신의 결여를 충족하고 현실을 유지하지만, 이는 우발적 사건을 통해 자신이 속한 질서의 불완전함과 마주한다. 이 과정에서 권기용, 안순덕, 신하사 등은 상징적 질서의 결여를 받아들이고 이데올로기적 환상을 가로지름으로써 분리의 과정을 완수한다. 반면, 소시민적 지식인인 오석태는 상징적 질서의 결여는 인지하지만 ‘행위’는 하지 않는 냉소적 주체로 남아 오히려 이데올로기의 작동에 일조하는 분열된 주체로 남는 모습을 보인다.
Ⅲ장에서는 윤흥길 소설 속 증상적 인물과 윤리적 주체의 행위의 특성을 다룬다. 상징적 질서의 불완전함을 인지한 인물들은 그 불완전함을 상연하는 ‘행위’를 통해 윤리적 주체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는 상징적 질서의 작동을 중단시킨다는 점에서 체제의 적대적 인물로 낙인찍힌다. 안순덕은 공장이라는 자본주의적 공간의 모범적 노동자였으나 공장의 안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전락하고, 신하사는 군대라는 규율적 공간의 모범적 군인이었으나, 우하사라는 “채색된 영웅”을 살해하는 반역자로 낙인찍힌다.
‘행위’는 반복과 정치적 진리라는 특성을 지닌다. 주체의 행위와 주체화의 과정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는 단순한 실패가 아닌 미래의 행위의 잠재적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권기용은 두 번의 ‘행위’를 보여주는데, 광주 대단지에서의 실패는 권기용을 무능력자로 만들어 놓지만 두 번째 행위를 통해 단순한 실패에서 두 번째 행위의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소급적으로 부여 받는다. 즉 행위는 실패라는 결과를 마주하지만 다시 반복된 행위를 통해 소급적으로 성공의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진리의 정치성은 보편적 진리라는 기표 속에 이미 부르주아적 편향성이 존재하기에 진정한 보편적 진리는 프롤레타리아적 주체들을 향한 편향 속에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 권기용이 동일시를 이루는 증상이 ‘철거민’, ‘빈곤 노동자’라는 점에서 권기용의 행위는 진리의 정치성에 충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윤흥길의 산업화 시대의 소설은 개발독재 체제의 이데올로기 속의 주체가 변모하는 과정을 통해, 억압적 이데올로기와 그에 대한 대응 양상을 드러낸다. 특히, 개발독재 체제라는 강력한 타자를 중지시키는 주체가 강력한 힘을 가진 영웅적 인물이나 외부적 위반의 인물이 아니라, 체제 내부의 모범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질서와 주체화의 핵심이 드러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 국문요지
- Ⅰ. 서론
- 목차
- ▣ 국문요지
- Ⅰ. 서론
- 1. 연구사 검토 및 문제 제기 1
- 2. 연구의 방법 및 목적 7
- Ⅱ. 윤흥길 소설 속 개발독재 논리와 그 증상
- 1. 개발독재 이데올로기와 주체의 소외 15
- 2. 이데올로기의 불가능성과 분리 28
- Ⅲ. 윤흥길 소설 속의 윤리적 행위의 양상
- 1. 윤리적 주체와 행위 37
- 2. 행위의 반복과 진리의 정치성 50
- Ⅳ. 결론 57
- ▣ 참고문헌
- ▣ ABSTRACT
- ▣ 연구윤리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