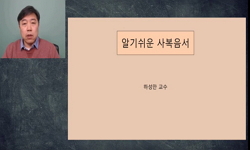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textual acception of the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the modern Korean novel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attempts of modern writers to recognize t...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 성서 수용 양상 연구 = The Study on the Aspects of Accepting the Bible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 Korean Novels
한글로보기https://www.riss.kr/link?id=T171479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 국어국문학과 , 2025. 2
-
발행연도
202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소설과 성서 ; 문학으로서의 성서 ; 예표론 ; 전상 ; 후상 ; 공의 ; 회심 ; 중생 ; 천지창조 ; 복음서 ; 예수 그리스도 ; Novel and the Bible ; The Bible as Literature ; Typology ; Prefiguraion ; Postfiguration ; God's Justice ; Conversion ; Born Again ; The Creation ; Gospel ; Jesus Christ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경수
-
UCI식별코드
I804:11029-000000079691
- 소장기관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narrows the focus from the broader conne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modern Korean novel and applies th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The Bible as Literature' to the works of Kim Pil-soo, Ahn Kook-sun, Lee Hae-jo, Jeon Young-taek, Nae Hye-seok, Kim Dong-in, Na Do-hyang, and Lee Kwang-soo, writers who specifically demonstrate the textual acception of the Bible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 Korean novel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the early 1920s, in order to reveal the individual meanings and varieties in authorial intentions in the accception of the Bible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quotation, allusion, and parody.
Chapter Ⅱ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new novel writers perceiving the Bible as a jurisprudential text to be thought of in conjunction with legal justice and accepting it into their works. Chapter Ⅲ examined the ways in which writers such as Jeon Young-taek and Na Hye-seok literary appropriated the biblical concept of Born Again or The Creation in Genesis based on their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ary schools and churches when they sought to narratively express their modern selves. Chapter Ⅳ examines the active transformation of the Bible into novel that parodies the Bible as a ur-text, or that places the biblical Jesus and the novel's protagonist in a typological framework of prefiguration and postfiguration to characterize a national Christ.
The content of the Bible in modern Korean novel during the formation period tends to be more heavily weighted toward Genesis that contains The Creation and the lost paradise of Adam and Eve; prophetic books such as Isaiah and Jeremiah which contain power critiques of Israel's priesthood; poetry books such as Psalms, Proverbs, and Ecclesiastes, which constitute 'Literature in the Bible'; and the Gospels, which focus on the pass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when writers accepted the Bible in the specific sense of alternative jurisprudence, the modern self, absolute art, or national salvation, they did not do so as part of a religious imagination or theological inquiry, but rather as a recontextualization of the Bible that the writer used to promote self-understanding or overcome the reality of their colonial situation. The frequent use of the Bible in the texts of modern Korean novel is a literary fact that deserves attention in its own right, and its full meaning can only be grasped by closely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and the Bible. This is why it is imperative to read modern Korean novel 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Bibl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t seek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meaning of the acception of the Bible.
Although this dissertation limits its scope to the formation period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the early 1920s, and reveals a gradual shift in perception from religious scripture to literature and a part of narrative acception afte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Furthermore,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acception of the Bible according to the unfolding of the literary history is a task for subsequent research, and the cross-reading of the novel and the Bible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will renew the meaning network of modern Korean novel.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investigate the specific textual acception of the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the modern Korean novel and the significance of the literary attempts of modern writers to recognize the Bible as a narratively available text and to accept it into their novels. This dissertation considers the Bible as literature that can be read from various angles and utilized in the writing of novels apart from the issue of faith, and focuses on the individual literary meanings of the acceptance of the Bible and the integrative significance of the Bible as literature on the modern Korean novel during the formation period.
To this end, this dissertation narrows the focus from the broader connection between Christianity and modern Korean novel and applies the perspective and methodology of 'The Bible as Literature' to the works of Kim Pil-soo, Ahn Kook-sun, Lee Hae-jo, Jeon Young-taek, Nae Hye-seok, Kim Dong-in, Na Do-hyang, and Lee Kwang-soo, writers who specifically demonstrate the textual acception of the Bible during the formation period of modern Korean novel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the early 1920s, in order to reveal the individual meanings and varieties in authorial intentions in the accception of the Bible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quotation, allusion, and parody.
Chapter Ⅱ focused on the phenomenon of new novel writers perceiving the Bible as a jurisprudential text to be thought of in conjunction with legal justice and accepting it into their works. Chapter Ⅲ examined the ways in which writers such as Jeon Young-taek and Na Hye-seok literary appropriated the biblical concept of Born Again or The Creation in Genesis based on their Christian education in missionary schools and churches when they sought to narratively express their modern selves. Chapter Ⅳ examines the active transformation of the Bible into novel that parodies the Bible as a ur-text, or that places the biblical Jesus and the novel's protagonist in a typological framework of prefiguration and postfiguration to characterize a national Christ.
The content of the Bible in modern Korean novel during the formation period tends to be more heavily weighted toward Genesis that contains The Creation and the lost paradise of Adam and Eve; prophetic books such as Isaiah and Jeremiah which contain power critiques of Israel's priesthood; poetry books such as Psalms, Proverbs, and Ecclesiastes, which constitute 'Literature in the Bible'; and the Gospels, which focus on the passion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his means that when writers accepted the Bible in the specific sense of alternative jurisprudence, the modern self, absolute art, or national salvation, they did not do so as part of a religious imagination or theological inquiry, but rather as a recontextualization of the Bible that the writer used to promote self-understanding or overcome the reality of their colonial situation. The frequent use of the Bible in the texts of modern Korean novel is a literary fact that deserves attention in its own right, and its full meaning can only be grasped by closely recogn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vel and the Bible. This is why it is imperative to read modern Korean novel in the context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Bible and the significance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t seeks to understand the phenomenon and meaning of the acception of the Bible.
Although this dissertation limits its scope to the formation period from the enlightenment period to the early 1920s, and reveals a gradual shift in perception from religious scripture to literature and a part of narrative acception after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into Korean. Furthermore,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acception of the Bible according to the unfolding of the literary history is a task for subsequent research, and the cross-reading of the novel and the Bible presented in this dissertation will renew the meaning network of modern Korean novel.
국문 초록 (Abstract)
이를 위해 본고는 기독교와 한국 근대문학 간의 포괄적인 관련성으로부터 초점을 좁혀, ‘문학으로서의 성서(The Bible as Literature)’라는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화기부터 1920년대 초에 이르는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에 성서의 텍스트적 수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작가들인 김필수, 안국선, 이해조, 전영택, 나혜석, 김동인, 나도향, 이광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인용, 인유, 패러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서 수용 양상의 개별적 의미와 작가적 의도의 편차를 드러내었다.
Ⅱ장에서는 한글 성서의 번역 이후 외국인 선교사나 조선인 목사의 선교소설에서 성서가 종교적 경전으로 인용되는 포교적 글쓰기가 대두되던 상황에 신소설 작가들이 성서를 법적 정의(legal justice)와 연동하여 사유할 법리적(法理的) 텍스트로 인식하고 작품 속으로 차용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김필수의 『경세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토론체 신소설은 근대법의 이입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개화기 사법현실을 성서에서 신의 속성으로 언급되는 공의(公義) 개념에 의탁하여 예언서의 인용을 통해 비판하고 신적 정의(God’s justice)를 희구한다. 그리고 이해조의 『고목화』, 작자 미상의 『광야』처럼 법적 서술과 더불어 범죄를 이야기의 중핵사건으로 설정하는 신소설의 경우 사적 복수나 공적 재판에 의한 문제 해결의 법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회심(回心)에 의한 악인의 개선과 용서를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한다. 신소설의 성서 수용은 성서의 문학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성서를 경전으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의 서사적 목적에 따라 맥락을 달리하여 차용한 초기적 현상이었다.
Ⅲ장은 전영택, 나혜석을 위시한 작가들이 근대적 자아를 서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미션스쿨과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양으로 쌓은 성서 읽기에 기반하여 성서 속의 거듭나는 생명(重生)이나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문학적으로 인유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전영택은 「생명의 봄」에서 중생에 의한 근본적 변화를 발전적 인물 형상화와 이야기상의 급전의 계기로 활용하여 소설 속 주인공이 근대 예술가로 신생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나혜석은 「경희」에서 전통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창세기」의 양성(兩性) 분리 이전의 원형적 인간을 전략적으로 인유하여 신여성의 자아 각성을 관철하였다. 전영택과 나혜석의 소설적 사례는 서사적으로 구성되는 자아에 성서가 내러티브적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Ⅳ장은 성서의 부분적 차용이나 인유의 차원을 넘어 성서를 원-텍스트로 삼아 패러디하거나 성서의 예수와 소설의 주인공을 전상(prefiguration)과 후상(postfiguration)이라는 예표론적 구도 위에 두고 민족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적극적인 성서의 소설적 변용을 고찰하였다. 김동인과 나도향은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직접적인 원-텍스트로 삼고 예수를 소설적 인물로 인격화하거나 성서를 거스르는 반기독교적 수사를 동반하여 자아를 절대화하였다. 이광수는 실존하는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포착하되 민족의 그리스도로 부조하여 민족적 구원의 실현이라는 수행적 의도를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성서의 소설적 변용의 스펙트럼은 식민지 작가의 특성을 분별할 하나의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형성기 한국 근대소설에서 수용되는 성서의 내용은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서신서보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실낙원이 기록된 「창세기」,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향한 권력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 「시편」, 「잠언」, 「전도서」처럼 ‘성서 속의 문학’에 해당하는 시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줄거리로 삼고 있는 복음서가 편중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안적 법리, 근대적 자아, 절대적 예술, 민족적 구원이라는 구체적 의미처럼 작가들이 성서를 수용할 때, 종교적 상상력 혹은 신학적 탐구의 일환으로 시도했다기보다는 해당 작가가 자기 이해를 도모하거나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성서를 재맥락화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근대소설 텍스트에 빈출하는 성서는 자체로 주목되어야 할 문학적 사실이며, 소설과 성서의 관계를 면밀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근대소설이 성서라는 텍스트와의 관계망 위에서 독해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와 성서 수용의 실제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에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의 성서(聖書, The Bible)가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에 텍스트상으로 특정하게 수용되는 양상과 근대작가들이 성서라는 종교적 경전을 서사적으...
본 연구의 목적은 개화기에 한글로 번역된 기독교의 성서(聖書, The Bible)가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에 텍스트상으로 특정하게 수용되는 양상과 근대작가들이 성서라는 종교적 경전을 서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텍스트로서 인식하고 소설에 도입한 문학적 시도의 의의를 구명하는 데에 있다.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 작가들에게 성서는 기독교 신앙의 문제와는 별도로 다양한 각도와 독법으로 읽고 소설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문학적 텍스트였다고 간주하고, 성서 수용의 개별적인 문학적 의미와 성서라는 텍스트가 형성기 한국 근대소설에 미친 통합적 의의를 밝히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의식을 두었다.
이를 위해 본고는 기독교와 한국 근대문학 간의 포괄적인 관련성으로부터 초점을 좁혀, ‘문학으로서의 성서(The Bible as Literature)’라는 시각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개화기부터 1920년대 초에 이르는 한국 근대소설 형성기에 성서의 텍스트적 수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작가들인 김필수, 안국선, 이해조, 전영택, 나혜석, 김동인, 나도향, 이광수의 작품을 대상으로 인용, 인유, 패러디 등의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지는 성서 수용 양상의 개별적 의미와 작가적 의도의 편차를 드러내었다.
Ⅱ장에서는 한글 성서의 번역 이후 외국인 선교사나 조선인 목사의 선교소설에서 성서가 종교적 경전으로 인용되는 포교적 글쓰기가 대두되던 상황에 신소설 작가들이 성서를 법적 정의(legal justice)와 연동하여 사유할 법리적(法理的) 텍스트로 인식하고 작품 속으로 차용하는 현상에 주목하였다. 김필수의 『경세종』, 안국선의 『금수회의록』 같은 토론체 신소설은 근대법의 이입에도 불구하고 법적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지 않는 개화기 사법현실을 성서에서 신의 속성으로 언급되는 공의(公義) 개념에 의탁하여 예언서의 인용을 통해 비판하고 신적 정의(God’s justice)를 희구한다. 그리고 이해조의 『고목화』, 작자 미상의 『광야』처럼 법적 서술과 더불어 범죄를 이야기의 중핵사건으로 설정하는 신소설의 경우 사적 복수나 공적 재판에 의한 문제 해결의 법리적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서를 소재로 등장시키고 회심(回心)에 의한 악인의 개선과 용서를 대안적 방법으로 제시한다. 신소설의 성서 수용은 성서의 문학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이루어진 결과는 아니지만, 성서를 경전으로서만 이해하지 않고 텍스트의 서사적 목적에 따라 맥락을 달리하여 차용한 초기적 현상이었다.
Ⅲ장은 전영택, 나혜석을 위시한 작가들이 근대적 자아를 서사적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미션스쿨과 교회에서 기독교적 교양으로 쌓은 성서 읽기에 기반하여 성서 속의 거듭나는 생명(重生)이나 「창세기」의 천지창조를 문학적으로 인유한 양상을 검토하였다. 전영택은 「생명의 봄」에서 중생에 의한 근본적 변화를 발전적 인물 형상화와 이야기상의 급전의 계기로 활용하여 소설 속 주인공이 근대 예술가로 신생하는 과정을 묘사하였다. 나혜석은 「경희」에서 전통적으로 소외된 여성을 사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자 「창세기」의 양성(兩性) 분리 이전의 원형적 인간을 전략적으로 인유하여 신여성의 자아 각성을 관철하였다. 전영택과 나혜석의 소설적 사례는 서사적으로 구성되는 자아에 성서가 내러티브적 모델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증명한다.
Ⅳ장은 성서의 부분적 차용이나 인유의 차원을 넘어 성서를 원-텍스트로 삼아 패러디하거나 성서의 예수와 소설의 주인공을 전상(prefiguration)과 후상(postfiguration)이라는 예표론적 구도 위에 두고 민족의 그리스도를 형상화하는 적극적인 성서의 소설적 변용을 고찰하였다. 김동인과 나도향은 신약성서의 복음서를 직접적인 원-텍스트로 삼고 예수를 소설적 인물로 인격화하거나 성서를 거스르는 반기독교적 수사를 동반하여 자아를 절대화하였다. 이광수는 실존하는 도산 안창호를 모델로 포착하되 민족의 그리스도로 부조하여 민족적 구원의 실현이라는 수행적 의도를 실천하였다. 이와 같은 성서의 소설적 변용의 스펙트럼은 식민지 작가의 특성을 분별할 하나의 기준이 됨을 시사한다.
형성기 한국 근대소설에서 수용되는 성서의 내용은 구약의 역사서나 신약의 서신서보다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의 실낙원이 기록된 「창세기」,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향한 권력 비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예언서, 「시편」, 「잠언」, 「전도서」처럼 ‘성서 속의 문학’에 해당하는 시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을 줄거리로 삼고 있는 복음서가 편중된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대안적 법리, 근대적 자아, 절대적 예술, 민족적 구원이라는 구체적 의미처럼 작가들이 성서를 수용할 때, 종교적 상상력 혹은 신학적 탐구의 일환으로 시도했다기보다는 해당 작가가 자기 이해를 도모하거나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성서를 재맥락화하여 사용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국 근대소설 텍스트에 빈출하는 성서는 자체로 주목되어야 할 문학적 사실이며, 소설과 성서의 관계를 면밀하게 인식해야 비로소 온전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한국 근대소설이 성서라는 텍스트와의 관계망 위에서 독해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와 성서 수용의 실제와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 본 연구의 의의는 여기에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기존논의 검토 및 문제제기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4
- Ⅱ. 신소설의 법리적 텍스트로서의 성서 차용 23
- Ⅰ. 서론 1
- 1. 기존논의 검토 및 문제제기 1
- 2.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4
- Ⅱ. 신소설의 법리적 텍스트로서의 성서 차용 23
- 1. 공의(公義)를 통한 사법현실 비판: 김필수, 안국선 25
- 2. 회심에 의한 범죄이야기의 굴절: 이해조 37
- Ⅲ. 근대적 자아의 서사적 모형으로서의 성서 인유 48
- 1. 거듭나는 생명(重生)과 예술가의 신생: 전영택 49
- 2. 천지창조와 신여성의 자아 각성: 나혜석 62
- Ⅳ. 성서의 소설적 변용과 식민지 작가의 분기 74
- 1. 복음서의 패러디로서의 소설: 김동인, 나도향 75
- 2. 예표론적 소설 쓰기와 민족의 그리스도: 이광수 91
- Ⅴ. 결론 99
-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