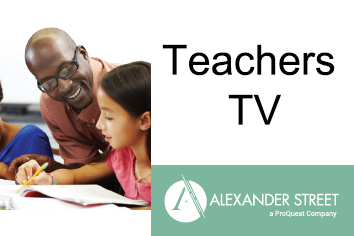6·25전쟁기념물 중 비와 탑은 다른 유형의 기념물보다 수가 많다. 비와 탑은 형태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면에 글씨를 세로로 적음으로써 비의 형태이면 서도 지대석과 기단을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209204
-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20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6·25전쟁 ; 전쟁기념물 ; 탑 ; 비 ; 기록 ; 기념 ; 기억 ; 전통 ; 공동체 ; 반공 ; Korean War ; War Memorial ; Pagoda ; memorial stone ; Record ; commemoration ; memory ; tradition ; Community ; Anti-Communist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수록면
29-57(29쪽)
-
KCI 피인용횟수
0
- DOI식별코드
- 제공처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6·25전쟁기념물 중 비와 탑은 다른 유형의 기념물보다 수가 많다. 비와 탑은 형태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전면에 글씨를 세로로 적음으로써 비의 형태이면 서도 지대석과 기단을 둠으로써 건축적인 탑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이다. 탑과 비는 장소를 이동하거나 규모를 확장하면서 형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 많다. 비, 탑 그리고 위패를 봉안하는 사당과 결합된 6·25전쟁기념물은 일정한 주기의 양식을 도출하기도, 이행되는 과정을 결정짓기도 어렵다. 그것은 식민지의 혼성 문화와도 같이 원형과 형식이 결합하고 난무한 공간으로 보인다.
전적지, 전쟁기념물이 조성된 공간은 6·25를 상기하는 장소로서 반공의 의미를 다지는 장소만이 아니라 평화를 생각하고 위무하는 공간이 되었다. 또한 그 고장에서 있었던 사람들과 사건을 만나는 역사적 관광지가 되었다. 하지만 기념물을 조성한 작가와 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게을리 한다. 건립 시점이 제거된 전쟁기념물의 기록 방식이야말로 한국전쟁의 성격 그리고 기념하거나 기록되어야 할 것들은 영원불멸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미 합의를 본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6·25전쟁기념물에서 보이는 비와 탑에서의 기록성은 내부 주체가 만들어낸 전통이다. 관아 옆 빈터에, 길목에 세웠던 선정비처럼 사건이 있던 장소의 비석이나 탑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설립되었다. 오늘날 많은 전쟁기념물이 도로 가까이 혹은 공원이나 주요 시설 입구에 자리잡게 되었다. 사건이 있던 장소에 세우는 기록에서부터 사람들이 함께 행사를 할 수 있는 기념의 공간으로 변화한 것이다. 현충일이나 국군의 날에 의례를 행하고 둘러보는 전쟁기념물은 공동의 기억을 소환하기 위한 장치이다. 사건으로부터 멀어진 시대에 개인과 개별성을 넘어 전쟁은 공동체의 경험으로 강조되고 기억되어야 했다. 이제는 ‘그들’이 되어버린 희생자는 과거로부터 소환되고 이야기 구조로 기록된다. 전쟁기념물은 기억의 호출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건재한 현재의 ‘적’들을 일깨우는 장치가 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War monuments have more memorial stones and pagodas than other types of monuments. In some cases, memorial stones and pagodas cannot be distinguished by their shape, as they were written vertically on the front and were constructed in the form ...
Korean War monuments have more memorial stones and pagodas than other types of monuments. In some cases, memorial stones and pagodas cannot be distinguished by their shape, as they were written vertically on the front and were constructed in the form of pagodas. The Korean War Monument which consists of memorial stones, pagodas, and shrines, cannot derive a certain cycle of style or determine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since memorial stones and pagodas often brought changes in their form by moving places or expanding their size. It appears to be a space of combination of archetypes and forms, like the mixed culture of the colonies.
The space where the battlefield and war memorial were created was not only a place to strengthen the meaning of anti-communism, but also a space for peace and consolation. It also became a historical tourist destination where we meet people and events that were occurred in the area. However, we neglect to record the author and the time when the monument was created. Recording war memorabilia without the construction date is the nature of the Korean War, and this might represent that an agreement has already been reached on “what should be commemorated and recorded is an eternal value”.
The recordability of memorial stones and pagodas in the Korean War monument is a tradition created by the insider. Memorial stones were located in the vacant lot next to the government office, like a monument built on the street. Today, many war monuments are located near roads or at the entrance to parks and major facilities. It has changed from the record set at the place where the incident occurred to a memorial space where people can hold events together. The war memorial, which is held and toured on Memorial Day or Armed Forces Day, is an object for summoning common memories. In an era away from events, wars, beyond individuality, had to be emphasized and remembered through community experience. Victims who are now ‘them’ are recalled from the past and recorded in story structure. The war memorial became an object to awaken the present “enemies” who are invisible but still present through the call of memor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 Ⅱ. 6·25전쟁 기념물 양상
- Ⅲ. 6·25전쟁 기념물의 비와 탑
- Ⅳ. 기념물의 이건(移建)과 변화
- Ⅳ. 맺음말
- Ⅰ. 머리말
- Ⅱ. 6·25전쟁 기념물 양상
- Ⅲ. 6·25전쟁 기념물의 비와 탑
- Ⅳ. 기념물의 이건(移建)과 변화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국문초록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이순, "현충탑(顯忠塔)의 기원과 형성" 미술사학연구회 (48) : 93-121, 2017
2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 선전·경험·기록"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3 박영현, "한국전쟁 戰績紀念物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2 : 2001
4 국가보훈처, "참전기념조형물도감" 1996
5 국방군사연구소, "참전기념물편람집"
6 김이순, "제국일본의 식민지배와 공공기념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34) : 7-34, 2017
7 홉스 보옴,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8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2009. 12. 15. 제정, 시행 2016. 7. 4. 국방부훈령 제1933호, 2016. 7. 4., 일부개정)"
9 안경화,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 전쟁"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1) : 167-186, 2010
10 강인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28 : 2006
1 김이순, "현충탑(顯忠塔)의 기원과 형성" 미술사학연구회 (48) : 93-121, 2017
2 최태만, "한국전쟁과 미술 : 선전·경험·기록"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9
3 박영현, "한국전쟁 戰績紀念物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42 : 2001
4 국가보훈처, "참전기념조형물도감" 1996
5 국방군사연구소, "참전기념물편람집"
6 김이순, "제국일본의 식민지배와 공공기념물"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34) : 7-34, 2017
7 홉스 보옴, "전통의 날조와 창조" 서경문화사 1995
8 "전적기념물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훈령(2009. 12. 15. 제정, 시행 2016. 7. 4. 국방부훈령 제1933호, 2016. 7. 4., 일부개정)"
9 안경화, "전쟁의 재구성: 기념관 속의 한국 전쟁"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21) : 167-186, 2010
10 강인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28 : 2006
11 정호기, "전쟁 상흔의 치유 공간에 대한 시선의 전환 - 한국에서의 전쟁 기념물을 중심으로 -" 5.18연구소 8 (8): 183-212, 2008
12 정호기, "전쟁 기억의 매개체와 담론의 변화: 지리산권의 한국 전쟁 기념물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68) : 68-100, 2005
13 조지 L. 모스, "전사자 숭배" 문학동네 2015
14 정호기, "일제하 조선에서의 전쟁사자 추모 공간과 추모 의례" 한국사회사학회 (67) : 129-164, 2005
15 인제문화원, "인제의 옛이야기"
16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5월 13일"
17 조은정,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조선전기까지의 조각" 2 : 1989
18 "선조실록 70권, 선조 28년 12월 20일"
19 정영호, "석조Ⅱ 국보14" 예경출판사 1986
20 폴 존슨, "새로운 미술의 역사" 미진사 2006
21 이순우, "벽제관 후면 언덕에 솟아오른 ‘전적기념비’의 정체는? 침략전쟁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랐던 그들만의 기념물" 민족문화연구소
22 조은정, "동상 : 한국 근현대 인체조각의 존재방식" 다할미디어 : Snifactory(에스앤아이팩토리) 2016
23 "돋보기"
24 전진성,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25 오카 마리, "기억 서사" 소명출판 2004
26 조은정, "기록의 재생과 기억의 구조물, 한국전쟁기념물" 41 : 2010
27 한성훈, "기념물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집단 정체성- 거창사건의 위령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사학회 (78) : 35-64, 2008
28 김혜진, "그리스 전장에서 승전조형물(트로파이온)의 전술적 의미 연구: 기원전 5세기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미술이론학회 (29) : 31-53, 2020
29 "국가보훈처 현충시설 정보서비스"
30 "공비 소탕의 공훈을 각명"
31 "골목길에 버려진 九·二八收復美軍勇士碑"
32 노명호,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 지식산업사 2012
33 문화재청, "경남·부산·울산 문화유산 이야기 여행"
34 "肉彈三勇士의 銅像除幕式"
35 "美談一束"
36 "結実(3) 顯忠塔 건립 國立墓地 모뉴먼트의 디자이너 崔起源 씨"
37 "白衣의 勇士를 爲하여 療養所, 授產施設"
38 "政府 6·25戦蹟地 50곳 集中개발"
39 "忠魂 社稷 兩公園에"
40 "張皷峯에 忠魂塔"
41 "建立工事着手 『서울』의 忠魂塔"
42 "于先 서울에一基竪立"
43 Judith R. Wasserman, "To Trace the Shifting Sands : Community, Ritual, and the Memorial Landscape" 17 : 1998
44 이상석, "6․25전쟁 기념공간에 나타난 기념적 표현" 한국전통조경학회 28 (28): 98-108, 2010
45 김미정, "1960-70년대 한국의 공공미술 : 박정희 시대 공공기념물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2010
46 김미정, "1950, 60년대 한국전쟁 기념물 - 전쟁의 기억과 戰後 한국국가체제 이념의 형성"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 10 : 2002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정무정(Chung Moojeong)
- 2020
- KCI등재
-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김이순(Kim Yisoon)
- 2020
- KCI등재
-
북한의 전후 복구 시기 조각 연구 - ‘일반조각’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신수경(Shin Sookyung)
- 2020
- KCI등재
-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 사이먼 몰리(Simon Morley)
- 2020
- KCI등재
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1-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근대미술사학회 ->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구 한국근대미술사학회)영문명 : Institute Of Korean Modern Art Studies -> Association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  |
| 2008-01-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근대미술사학 -> 한국근현대미술사학(구 한국근대미술사학)외국어명 : The Journal of Korean Art History -> Journal of Korean Modern & Contemporary Art History |  |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Art History |  |
| 2005-05-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근대미술사학 제11집 -> 한국근대미술사학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29 | 0.29 | 0.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37 | 0.37 | 1.029 | 0.06 |





 DBpia
DBpia